[金과장 & 李대리] 속옷 삐져 나온거 봐도 말 못하고 차 안에서 '뿡~'해도 웃지 못하고…아~내겐 너무 어려운 여성 상사
이런 상사 난감해요!
틀린 맞춤법으로 보고서 고쳐쓰고 재미없고 철 지난 유머 팍팍 날리고
먹기 싫은 음식 먹으라고 강요하고 부하 사무용품 아무때나 집어쓰고
![[金과장 & 李대리] 속옷 삐져 나온거 봐도 말 못하고 차 안에서 '뿡~'해도 웃지 못하고…아~내겐 너무 어려운 여성 상사](https://img.hankyung.com/photo/201407/AA.8864574.1.jpg)
차라리 업무 능력이 뒤처지거나 동료와 불화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받아들이기 쉽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이 명확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들도 많다. 소심하다는 타박 받을 까봐 어디에 속 시원하게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김 과장, 이 대리의 우여곡절 많은 애환을 들어봤다.
모른척 하기엔 마음에 걸리고…
신용카드회사에서 여성 부장을 모시고 있는 미혼남 최 주임(30)은 며칠 전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업무 보고를 하러 가면서 부장의 속옷이 겉옷을 비집고 나온 것을 발견해서다.
남성 상사라면 아무렇지 않게 “옷 좀 정리하세요”라고 얘기했겠지만 최 주임은 차마 그러지 못하고 진땀만 흘렸다. 그렇게 사내를 활보하는 부장을 보다 못해 동기인 김 주임(28·여)에게 부탁했다.
김 주임이 부장에게 얘기를 건네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누군가 얘기하겠지 하면서 모른 척 하기에도 마음에 걸리고 아무튼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몰라요.”
제조업체 신입사원 유모씨(28·남)도 최근 퇴근길에 선배 차를 얻어 탔던 기억을 떠올리면 식은땀이 난다. 속이 좋지 않다 싶더니 차 안에서 ‘뿡~’하는 소리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남자 선배였다면 그냥 웃어 넘겼겠지만 하필 여자 선배였다. 유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2분여를 보냈다.
“차마 그 순간 창문을 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선배가 민망했는지 나중에 직접 창문을 살짝 내리더라고요.” 동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먼저 행동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그냥 ‘왜 이리 덥지’ ‘아 답답해’ 등의 말을 하며 슬쩍 창문을 내리는 게 현명하다는 설명이다. 창문을 열지 않아 차 안에 냄새가 진동하면 그때는 이미 손쓸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좋은 게 좋은 거 라지만…
중견 마케팅회사에 근무하는 한 대리(32·남)는 업무 보고 때 울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올초부터 직속 상사가 된 팀장이 항상 ‘예컨대(O)’를 ‘예컨데(X)’로 잘못 쓰는 게 눈에 거슬려서다.
한 대리는 맞춤법에 무척 예민한 편이다. 애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친구들과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사용할 때조차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철저하게 지킬 정도다. 그런 한 대리지만 혹시 팀장의 자존심을 건드릴 까봐 맞춤법이 틀렸다는 걸 말하지도 못하고 고민만하고 있다. “본인만 실수를 하면 그나마 나아요. 어떨 땐 부하 직원들이 올린 보고서까지 잘못된 맞춤법으로 고쳐 놓으니 정말 난감합니다.”
팀장의 반복된 오류를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고민하던 한 대리는 부서의 천진난만한 막내 여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애교 있는 막내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팀 전체를 위해서라도 조만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대형 보험사에 다니는 박 대리(33·남)도 속앓이가 심하다. 박 대리는 친구들을 만나면 ‘재미없는 상사보다 더 최악은 재미없는데 유머 욕심까지 있는 상사’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유머 욕심이 강한 부장 때문에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철 지난 유행어다. 부장은 철이 지나다 못해 ‘조선시대 유머’까지 과감하게 시도한다. “점심 먹고 나니까 졸립지? 근데 연예인 중에서 가장 잠이 많은 연예인이 누군지 알아? 이미자~ 라고. 하하.”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 유머에 웃지도 못하고 인상 쓰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일그러지기 일쑤다. “버릇될까 봐 일부러 안 웃어준다는 동료들도 있는데 괜히 그러다가 부장 눈 밖에 날까봐 걱정되죠.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 스트레스라니까요.”
“처세 비법 어디 없나요?”
대형 건설사 재무팀에 근무하는 강 모씨(29)는 팀내 홍일점이다. 총 20여명의 팀원 가운데 나이가 지긋한 차장을 제외하면 여직원은 강씨가 유일하다. 강씨는 대학교 시절부터 외모와 몸매에 자신이 있는 편이었다. 큰 키와 늘씬한 몸매 덕분에 사내 모델로 뽑힐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동료와 커피 한 잔 사주겠다는 선후배들도 줄을 섰다.
이런 호의가 강씨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다. “어쩌다 남자 직원 한 명을 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동료들이 어찌나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는지 몰라요. 수틀리면 ‘일은 안 하면서 외모만 믿는다’ ‘어장 관리한다’는 식의 악성 소문까지 낸다니까요. 정말 남자들 입이 더 싸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속 편한 소리라고 하지만 안 겪어보면 몰라요.”
공기업에 다니는 임 대리(33·남)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자기 주장이 너무 확고한 상사 때문에 힘든 경우다. “부장이 기스면을 시켜도 볶음밥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는 기스면이 메인이야. 정말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하면서 메뉴를 강요한다니까요. 처음에 몇 번은 부장 의견을 존중해 메뉴를 주문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먹기 싫은 음식을 먹는 것도 싫고요. 계속 속에 담아 놓고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금융회사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천 대리(32·여)는 ‘아무리 사소한 사무용품이라도 내 것, 네 것은 제발 분명히 하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볼펜, 가위, 형광펜 등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부하 직원 책상에 있는 사무용품을 집어 쓰는 상사 때문이다. 사용한 뒤 제대로 챙기지 않아 잃어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갑자기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사용했으면 다시 돌려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쯤이야…’했던 볼펜이 부하 직원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완소 볼펜’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김은정/안정락/강경민/김동현 기자 ke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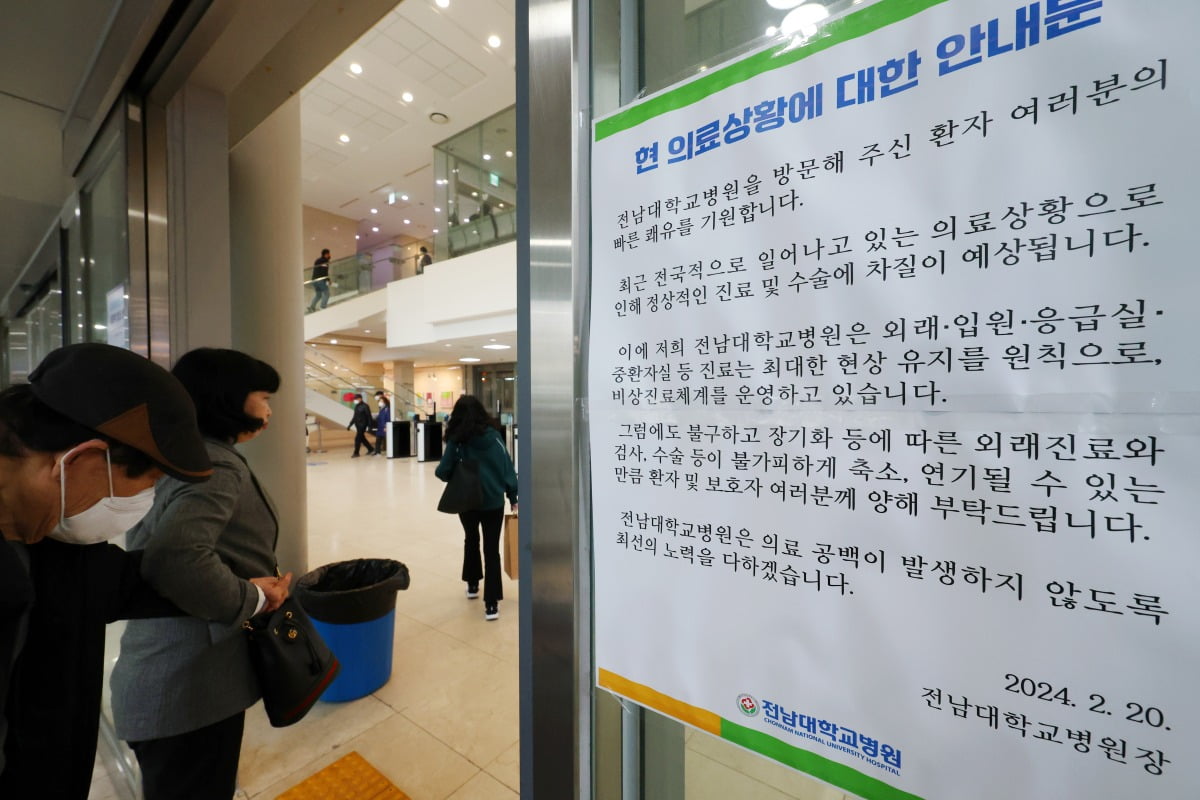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