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하루 6명 '극단적 선택'
경제력 상실이 주원인…자녀인 에코세대 자살률도 10년새 5배나 급증
정부 자살예방 예산 30억…일본의 2.4%에 불과
○사망원인, 암에 이어 2위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와 그들의 자녀들인 에코세대(1979~1992년생)의 동시 자살은 한국이 세대를 가리지 않는 ‘릴레이 자살’에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3일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의 자살 특성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붐세대의 10만명당 자살률이 2008년 31.4명에서 2011년에는 40.6명으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하루평균 6명의 베이비부머가 비극적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1년의 18.3명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살은 베이비붐세대의 사망원인 중 암(34.9%)에 이어 2위(11.6%)를 차지했다.
송태민 연구위원은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된 2010년을 전후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조기은퇴, 창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전인 1998년 들이닥친 외환위기에 따른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사태 등으로 1차 타격을 받은 것도 베이비부머의 경제능력 약화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자살 방지, 금연 예산의 7분의 1
베이비붐세대 슬하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유년을 보낸 에코세대들의 자살률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에코세대 자살률은 2001년 10만명당 4.8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 10.1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1년 24.5명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10년 사이 무려 5배나 급증한 것이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자 중 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요인이 컸다. 송 연구위원은 “부모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성인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많은 빚을 지게되거나 유례없는 청년취업난을 겪으면서 좌절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잇따른 자살이 에코세대의 모방자살 심리를 부채질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1년 이후 유명인의 자살 직후 1개월간 에코세대의 자살률은 전체 평균의 1.78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정부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33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웃나라 일본(1418억원)의 2.38%에 불과한 수준이다. 흡연방지 예산과 비교해도 7분의 1 수준이다. 한 복지 전문가는 “정부의 자살관련 대책을 살펴보면 ‘자살은 개인적 문제일 뿐’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자살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사회 공동체 유지의 건전한 축이 돼야 할 가정이 풍비박산하고 남아 있는 가족들도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자살로 이어지기 쉬운 우울증 진료와 치료(약값 포함)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300억여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울증이 얼마나 자살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다.
임원기/하헌형 기자 wonki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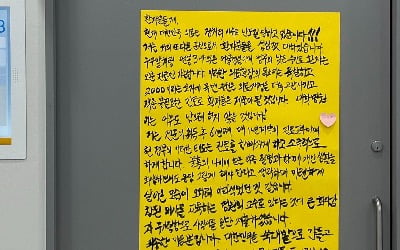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