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진짜 바뀌나] (2) "노조간부인 내가 봐도 베짱이 전임자 너무 많았어요"
출근도장만 찍고 일 안하는 유급 대의원들 작업장 'U턴'
투쟁에서 사원 복지로 노동 운동 중심 옮아가
노조 전임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전임자들이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문제 삼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잦았다.
임단협 시즌이 다가오면 이들은 현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강성노조였던 쌍용자동차노조의 한 조합원은 "평소에는 별로 일을 안하다가 파업 출정식이 있으면 파업만이 살길이라는 투로 투쟁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는"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제)는 진작 도입됐어야 했다"며 "그랬으면 노조가 이렇게 비대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서 노동현장이 달라지고 있다. 회사에서 월급받는 전임자 수가 감소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도 조직 비대화가 점차 줄어들고 합리적인 노동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베짱이 전임자'가 없어지는 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 지금까지 노조전임자는 일은 안하고 노조사무실에서 파업전략을 짜는 등 회사와 부딪칠 거리만 궁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과도한 노조전임자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왜곡시킨 주범으로 비난받아왔다. 그러나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노조 전임자들이 작업현장으로 돌아가고 있고 노조운동의 중심도 투쟁에서 복지로 옮아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노조 전임자 55명 중 30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 25명을 모두 작업현장으로 복귀시켰다. 지난 6월 말 개정 노조법의 타임오프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타임오프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강성노조 중 하나였던 쌍용자동차노조도 전임자 수를 37명에서 7명으로 줄이기로 했고 코레일(64명→18명)과 LG전자(27명→11명),농심(15명→5명),하이트맥주(9명→5명),한국타이어(9명→7명) 등이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단협을 체결했다. 사업장마다 최대 절반 이상의 전임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곳 가운데 70.3%(1016곳)가 8월 말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합의했다.
그동안 전임자 숫자는 노조권력의 상징처럼 작용했다. 힘이 센 강성노조일수록 전임자도 많았다. 여러 계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힘을 키워온 현대차,기아차노조에 전임자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90년대 중반만 해도 강성노조들마다 전임자 증원을 요구했고 생산차질을 우려한 회사 측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요구를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렇게 늘어난 전임자 중에는 자유시간을 갖거나 아예 출근을 안하는 이들도 있었다.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도 '그들만의 노동운동'을 펼친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노조전임자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왜곡됐던 노사관계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도 이제 경영합리화를 통해 군살 빼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고민 자체가 노동현장을 합리와 실리 위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노동조합들은 조직 내에 고용안정위원회,산업안전위원회 등 필요 이상의 위원회가 있다"며 "조직이 슬림화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기회에 선진국처럼 근로자의 후생복지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의 연착륙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32개 사업장이 타임오프제를 초과한 단협을 체결했다. 이면합의를 통해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한 사업장이 더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 교수는 "사측이 일정액의 수당을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이를 조합비로 거둬 전임자들의 임금을 주는 등의 편법 합의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타임오프제의 성공적 정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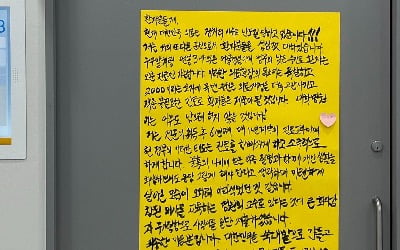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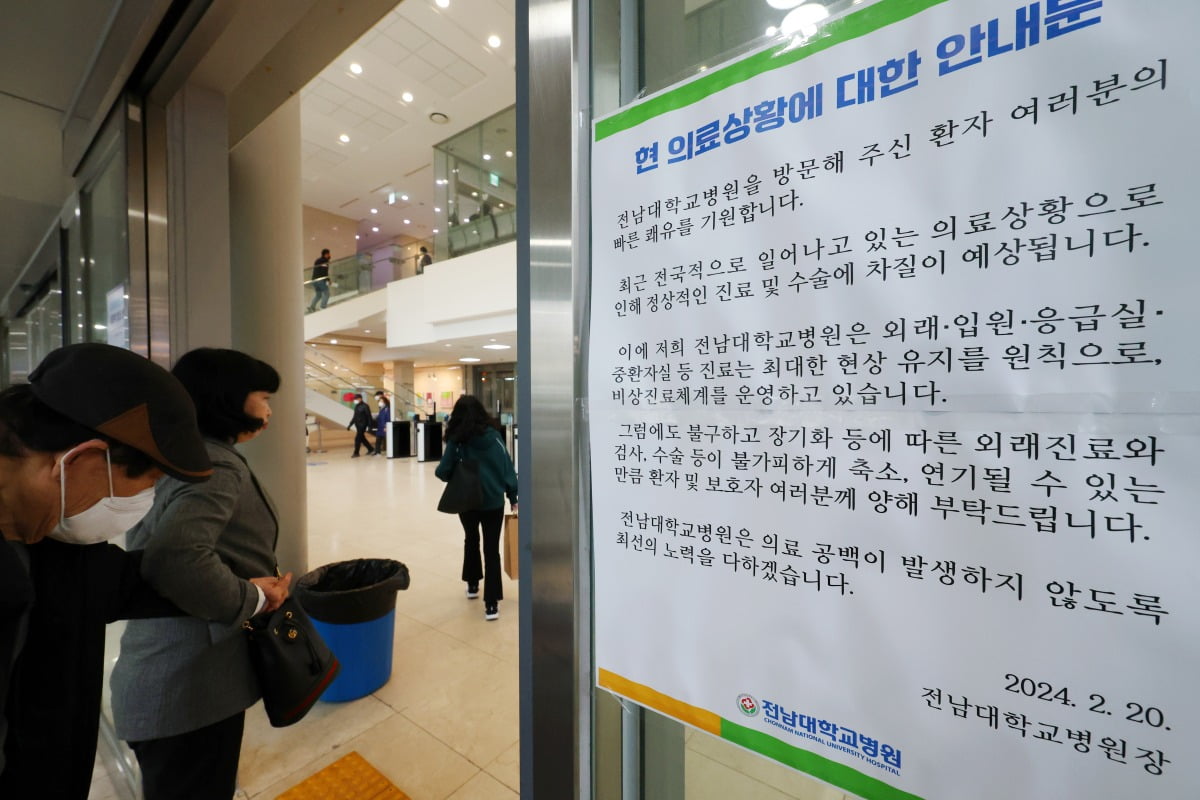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