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절대빈곤ㆍ경제 불평등 줄였다
1997년 33% 절대빈곤율…2006년엔 15.9%로 급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의뢰로 작성해 29일 발표한 '경제성장과 사회후생 간의 관계'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노동패널의 소득 · 소비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기간 중 절대빈곤율이 크게 감소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은 1997년 33%에서 2000년 28.9%로 하락한 뒤 2006년엔 15.9%로 낮아졌다.
강 교수는 "외환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절대빈곤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빈곤율은 농촌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방의 대도시,서울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개선됐으나 이후엔 나아지지 못했다. 가구당 소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1997년 0.349에서 2000년 0.341로 낮아진 뒤 이후 0.340을 전후해 움직이다 2006년엔 0.34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통상 0.4가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강 교수는 "이 기간 동안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빈곤층에 더 컸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7%에서 1999년과 2000년엔 각각 10.7%와 8.8%로 높아졌고 이후 평균 4~5%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고비용 구조로 바뀌면서 가구 내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적을수록 빈곤확률이 높았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또 정부와 당국이 재정 · 통화정책을 펼 때 정책이 부유층에 미치는 영향보다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률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타격이 부유층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통화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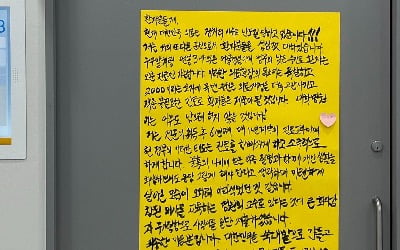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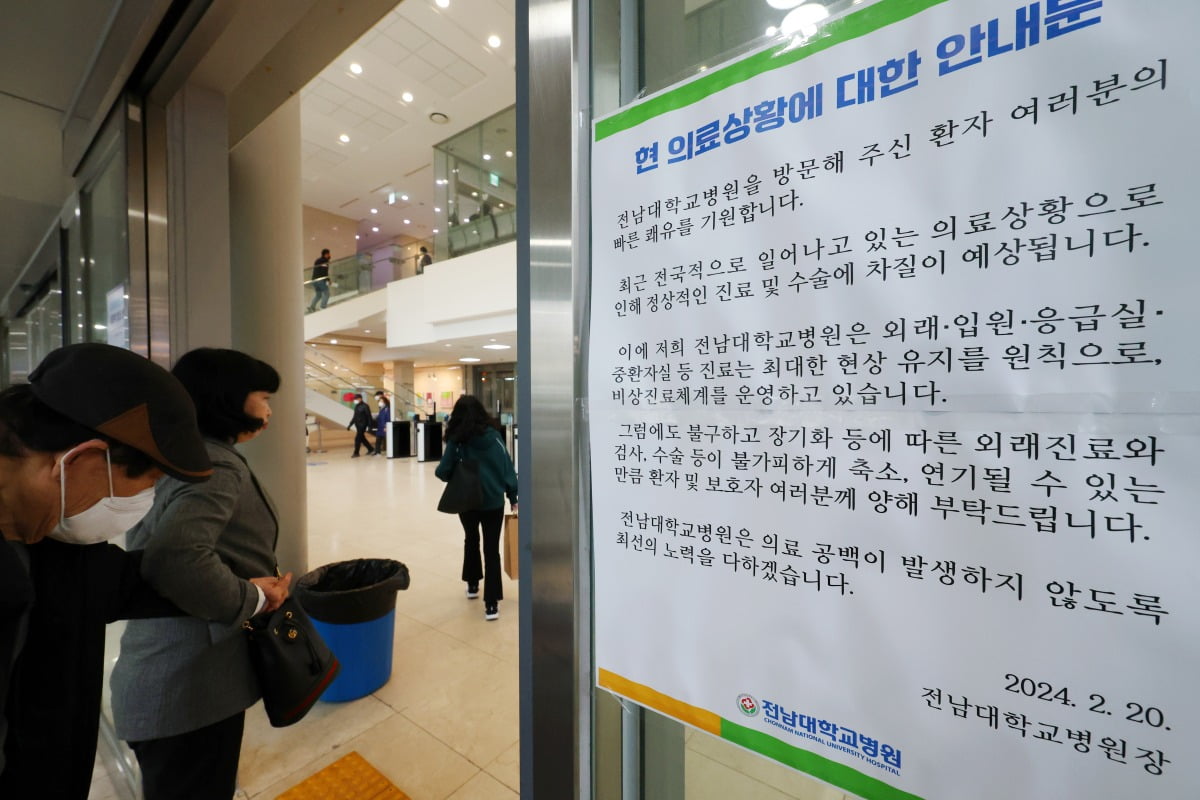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