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먹거리만큼 옷도 친환경이 중요해요"
세계 패션계에선 친환경을 강조하는 '그린패션'(Green fashion)이 화두다. 미국에선 린다 라우더밀크 등 유명 디자이너들까지 그린패션에 가세하고 있고,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진 브랜드 '룸스테이트'역시 친환경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유명 브랜드들이 고작 구색 갖추기용으로 그린패션 제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유명 디자이너나 의류업체가 아닌 한 주부가 '착한 옷 만들기'에 본격 나서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심수연 에코티크 대표(45 · 사진).
'에코티크'는 피부 자극이 적은 40수 유기농 면으로만 만드는 친환경 의류 브랜드다. 지난해 8월 온라인숍 '수연'을 통해 첫선을 보인 데 이어 올 5월부터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인사동 쌈지길,명동의 편집숍 제이랜드 등에 잇따라 매장을 열고 아기 배냇저고리부터 남녀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에코티크의 옷은 △'천연 면' 라벨을 부착하고 △지퍼를 쓰지 않으며 △코코넛 껍질이나 대나무 단추만 쓴다. 염색,봉재,폐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예쁘고 편한 옷만 내놓는다는 게 에코티크의 브랜드 철학이다.
심 대표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지만,귀국 후 10여년간 영어 교육에 종사했다.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로 피부염을 앓으면서 스스로 그린패션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엔 피부가 민감해져 옷을 입는 게 큰 고통이었어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에코티크'가 탄생한 셈이죠."
브랜드 론칭을 준비한 것은 3년 전부터."요즘엔 국내에도 유기농 면,콩섬유,대나무 섬유 등 다양한 친환경 소재와 '이새''르 에코' 등 친환경 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백지상태여서 일일이 해외 사이트를 뒤져가며 정보를 얻어야 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우선 친환경 원료를 구하는 것부터 문제였다. "두부 찌꺼기에서 개발한 친환경 섬유를 한 업체가 수입했는데 수요가 부진해 5년도 안 돼 문을 닫고 말았어요. 국내에선 이런 소재들이 주로 기능성 양말,내복,속옷 등에만 쓰일 뿐 수요가 큰 패션 의류로 이어지지 못해 취급 업체를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 또 주문량이 소량이다 보니 취급 업체들로부터 퇴짜 맞기 일쑤였다. 온갖 패션박람회를 섭렵하며 정보를 수집한 끝에 한 친환경 섬유 생산업체를 잡아 옷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심 대표는 "온 국민이 유기농 음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지만 아직까지 의류 쪽에선 아기를 둔 엄마들 외엔 고객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매장을 찾아와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거나 재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는 "제작비가 만만치 않아 마진이 적지만 지금은 친환경 브랜드를 확립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의류뿐 아니라 커튼,침대커버 등 리빙 브랜드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안상미/사진=양윤모 기자 saram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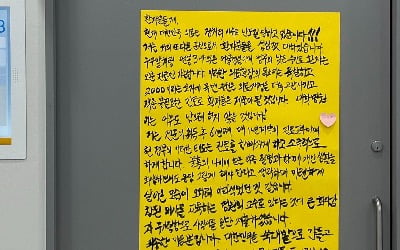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