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공익수의사법'서 '공익' 뺀 까닭은
단지 법안 이름(공익수의사법→공중방역수의사법)을 고치고 47곳에 등장하는 '공익수의사'라는 직함을 '공중방역수의사'로 개명한 게 고작이다. 도대체 수의사들에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걸까.
공익수의사법(2006년 제정)은 수의사 자격자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공익수의사'로 임명해 개업 수의사가 부족한 시골에서 가축 방역 업무를 보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의사들이 무의촌(無醫村)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마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수의사가 되려면 의대와 마찬가지로 예과와 본과를 합쳐 6년간 대학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또 국가고시를 친다.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이라는 자부심도 의사 못지않다. 그런데 '공익수의사'라는 명칭이 관공서 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과 비슷해 농민들이 공익근무요원의 일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골 사람들이 공중보건의에게는 '선생님,선생님' 하면서 깍듯하게 대하면서도 공익수의사를 보면 '이봐,젊은이' 등으로 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공익수의사가 농촌 지역 가축 방역에 긴요한 인력인데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서야 일할 맛이 나겠느냐"고 말했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건 좋지만 제발 직함에서만큼은 '공익'이라는 단어를 떼달라는 수의사들의 민원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수의사들의 사기가 정말 올라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특정 직업군에 대체 복무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혜택인데 명칭까지 고쳐 달라는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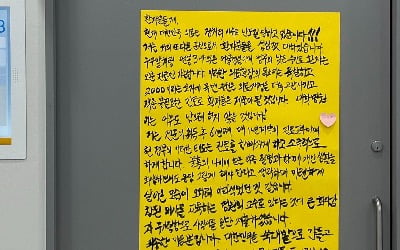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