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급증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타기관과 수사공조 안되고 신고 포상금도 줄어
◆기소율 절반 수준으로 '뚝'
27일 검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술 유출과 관련해 적발된 인원은 39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88명)보다 35.8% 증가했다. 그러나 기소된 인원은 약식기소 10명,불구속기소 42명,구속기소 9명 등 61명으로 오히려 지난해(78명)보다 감소했으며 기소율도 지난해(27.1%)의 절반 수준인 15.6%로 떨어졌다. 기술 유출 사범 10명 가운데 8~9명은 법정에도 서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신 기소유예가 4명에서 36명으로,증거불충분 등에 따른 '혐의 없음'이 205건에서 293건으로 급증했다.
기술 유출 사건 전문인 법무법인 지평 · 지성의 김범희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술 유출이 한창 이슈화된 2000년대 초에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많이 냈다"며 "그러나 점차 이공계 기술자들의 이직에 대한 자유 등 인권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원과 검찰이 기술 유출 사범 처벌에 대해 신중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법조계는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휴대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벨웨이브 사장 양모씨가 2005년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을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2000년 6월 삼성전자 전직 직원을 통해 휴대폰 관련 1급 대외비기술 28건을 빼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2003년 말 "양씨가 전직 직원의 기술 유출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을 냈고 2005년에는 검찰의 재상고도 기각했다.
◆검찰과 타기관 간 공조 '삐그덕'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3명을 증원해 첨단범죄수사2부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1부에서는 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토록 하는 등 기술 유출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들이 기술 유출 문제에 민감해지면서 사소한 사건도 일단 고소 · 고발로 걸고 넘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면이나 컴퓨터 디스크 등 물건을 빼왔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전직 직원을 영입해 해당 직원의 머리 속 지식이나 노하우를 이용한다면 사법 처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타 기관과의 허술한 공조도 검찰의 수사 및 기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검찰에서 기술 유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던 일본인이 출국정지 상태에서 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한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이 넘긴 피의자의 인적 사항 중 태어난 달이 여권 내용과 달라 출입국관리소가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기술 유출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예산도 지난해 62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기술 유출 사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인력은 늘리면서 포상금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 유출을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억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도원/이해성 기자 van7691@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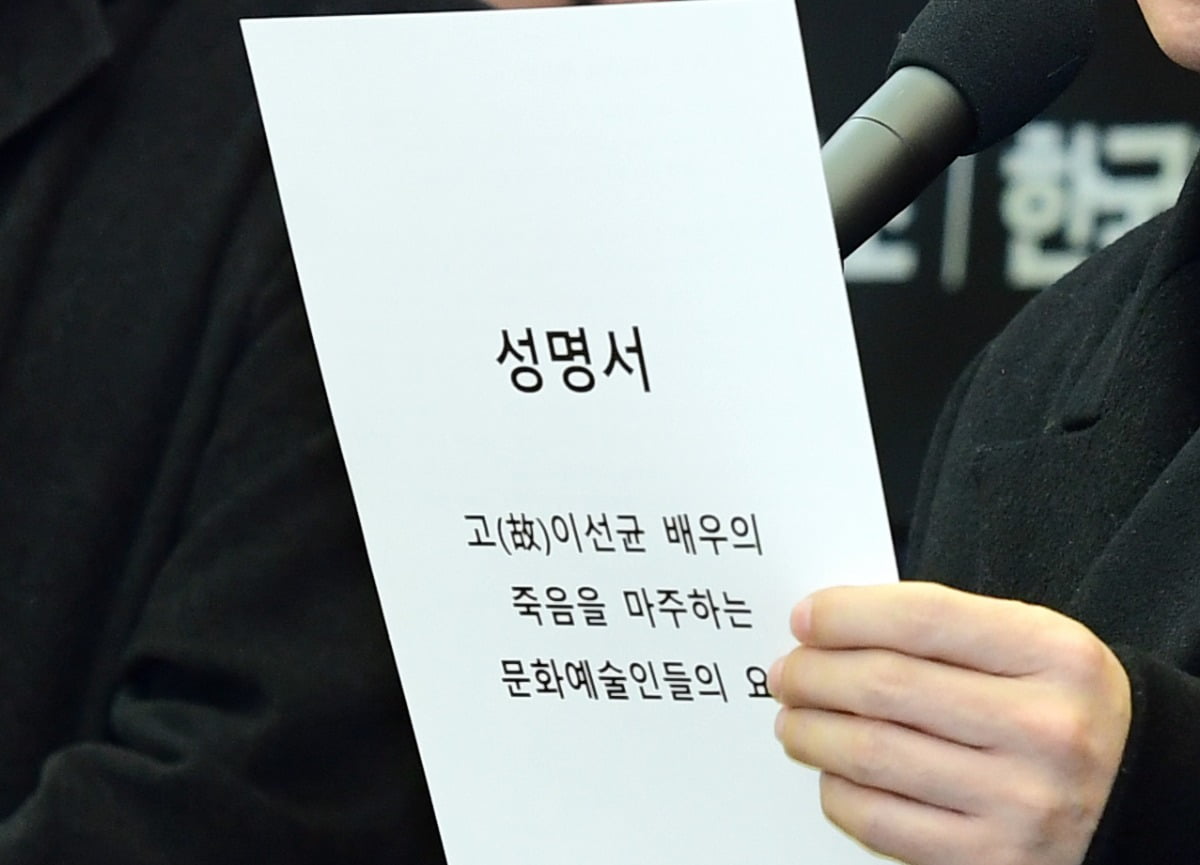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