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1세대' 비정규직 "법이 부실한 게 문제"
2005∼2006년 부산에선 '부지매'(부산지하철 매표소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라는 단어가 많은 이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
부지매의 일원이었던 황이라(30.여)씨. 그는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지기 2년 전인 2005년 9월 부산 지하철의 매표 업무 무인화 방침에 따라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7일부터 무려 423일간 시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부산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고, 덕분에 '비정규직 해고 1세대'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부지매의 일원이었던 황씨가 최근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논란을 지켜보며 느끼는 심경은 복잡하기만 하다.
2007년 말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도 황씨 등 부지매 근로자들의 투쟁이 큰 역할을 했지만 그들이 보기에 비정규직법은 처음부터 한계가 뻔한 법이었다.
"사용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한 2009년 7월이 되면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리란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죠"
그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고용 영역은 규정하지 않고 기한만 정해둔) 현행 비정규직법에서는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한 사측의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현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나처럼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돕고 싶었고 복직투쟁도 했기에 자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답답한 심정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가장 답답해하는 현실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홀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동종 업계에서 '눈 밖에 나면' 일자리를 더욱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부지매'의 또 다른 일원이었던 김모(36)씨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었다.
김씨는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두달이 넘게 휴직했는데 협력업체 규정에 따라 두달 안에 복직하지 않으면 자동 퇴직이 된다"며 "정규직이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지매 농성이 끝난 지 3년이 지났지만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정치권의 무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이 아니라도 좋으니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지매는 2006년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민주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부지매 회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부산시의 중재안을 거부한 채 뿔뿔이 흩어졌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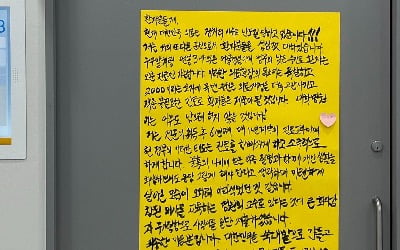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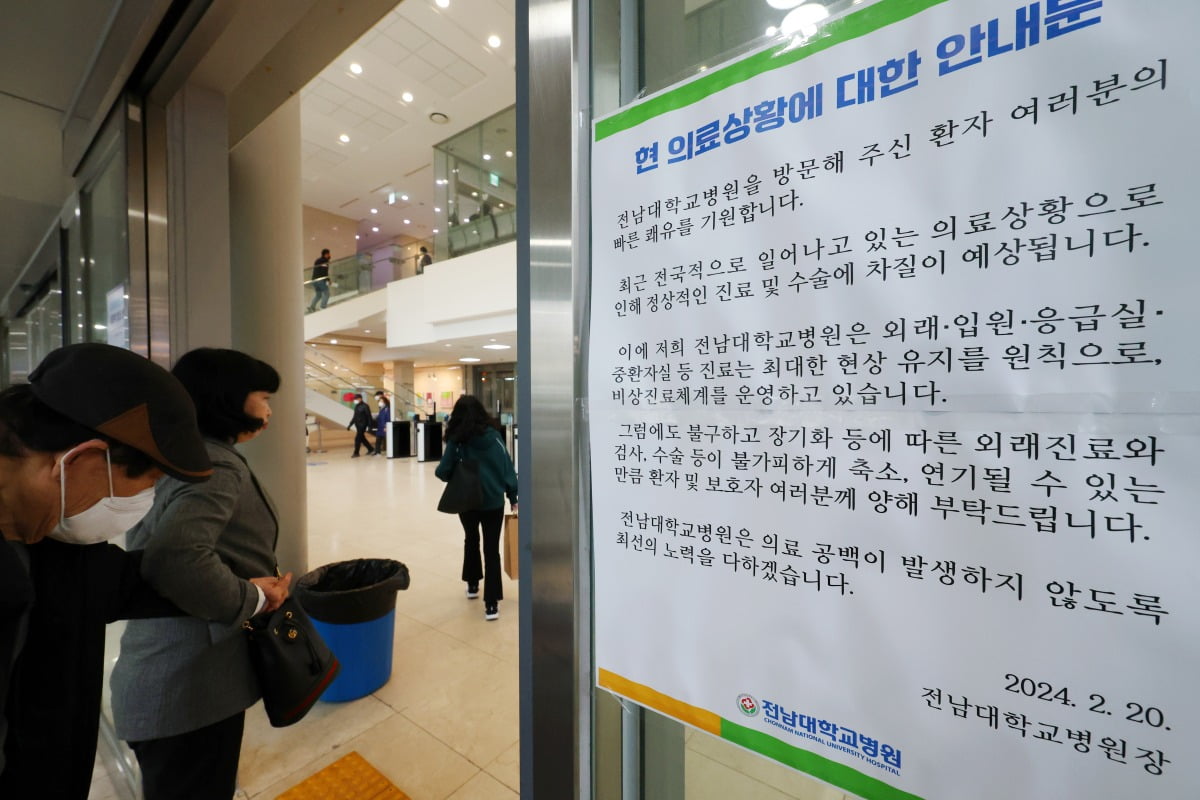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