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신종플루 늑장신고 '논란'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법정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나, 감염이 의심되지만, 확진이 내려지지 않은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이 발견되면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담당 의사는 처벌조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의료기관이 전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 등 대규모 감염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67명의 환자 중 상당수가 신종플루 감염사실을 모른 채 병원에 갔다가 의료진으로부터 관할 보건소에 갈 것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이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
여의사의 경우 7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소화기 관련 학회에 다녀온 뒤 10일 발병증세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2일 자체 유전자검사(리얼타임 RT-PCR)를 실시해 15일 신종플루로 확진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은 그 이후다.
서울대병원은 이에 대해 "당시 여의사는 인후통과 콧물증세가 있었지만 신종플루 감염 시 체온기준(37.8도 이상)에 못미치는 37.1도여서 신종플루보다는 계절인플루엔자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의사환자'로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여의사가 잠복 기간 진료 시 보호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했고 증세가 확인된 뒤 격리조치됐으며 긴밀 접촉자에 대해서는 타미플루 투약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여의사는 미국 체류기간에 3일을 신종플루 발생이 많은 뉴욕에서 보냈다.
발열기준에는 못미치지만 신종플루와 증세가 유사하고 '오염지역 체류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것이다.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여의사의 상태, 역학적 연관성을 보고 의사환자로 분류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더욱이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이 감염될 경우 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이 누구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오후 여의사의 신종플루 감염 여부가 공식 확인되는대로 서울대병원에 대한 경위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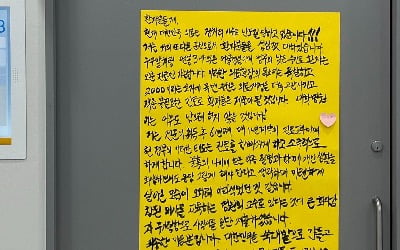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