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유전자은행, 방범효과 있다"
이 연구관이 작성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의 이론과 국제 현황'에 따르면 유영철 사건 등 현대 강력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범죄자 유전자은행 구축의 목적은 용의자가 없는 사건에서 용의자를 검색해 지목하는 일로,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찾기는 어렵지만 강력범죄의 특성상 DNA는 남기 마련이라서 범인 검거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성폭행범은 8차례 범행 뒤에야 비로소 체포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100여명을 성폭행한 `대전발바리'가 10년 만에 검거된 사례처럼 성폭행 사건은 숨겨진 연쇄 범행이 많다는 것이다.
이 연구관은 "DB를 구축하면 유전자형이 입력된 사람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의욕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범인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연쇄 범행을 막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형자 DNA 자료는 법무부에 속한 검찰이, 피의자 단계에서의 DNA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보안성, 안전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1995년 4월 범죄자 DNA DB를 구축했지만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한 건 3∼4년 지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도 법률 제정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살인ㆍ방화ㆍ성폭행ㆍ강도ㆍ유괴ㆍ감금ㆍ마약 등 11개 중범죄 가해자들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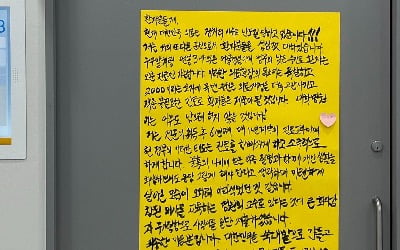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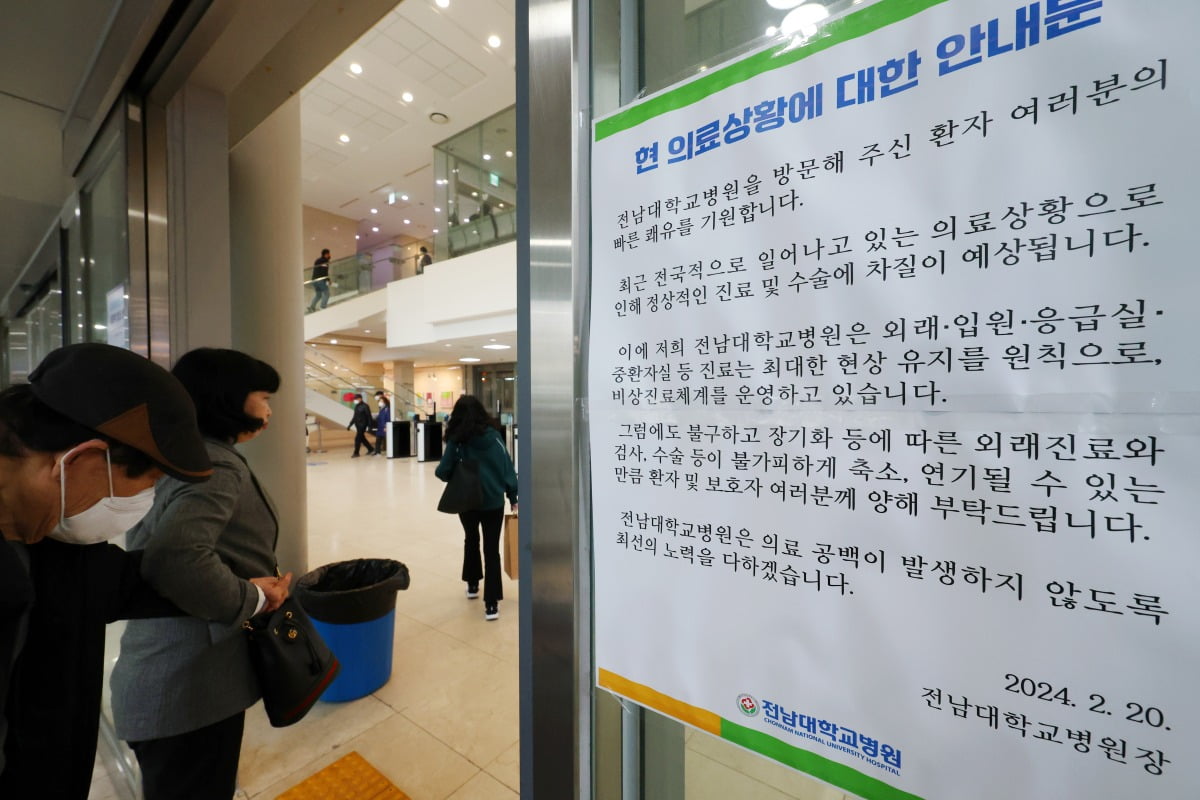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