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허탕"…새벽 인력시장 살풍경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A인력소개소 앞. 새벽 5시가 되자 하룻거리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주어지는 일거리는 대부분 건설현장의 단순 막노동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고소득 전문직보다 소중하다.
작업복과 신발이 든 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이모(55)씨가 동병상련의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기 시작한 지 몇 분이나 흘렀을까.
사무실에서 나온 인력사무소 관계자의 입에서 대뜸 모두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말이 나왔다.
"일거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당뇨로 시력이 많이 나빠져 단순 노무로 생계를 잇는 그는 불황 탓인지 최근들어 일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 헛걸음하는 횟수가 잦아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작년 말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허탕을 치는 것 같다"며 "대학생 아들 학비는커녕 전기료도 내기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다른 구직자 김모(45)씨는 "작년에는 비수기라도 한달에 20일 이상은 일했는데 지난달부터 일거리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고개를 떨궜다.
사상 최악의 불황으로 건설경기가 꽁공 얼어붙으면서 매일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드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다.
일당 5만원이라도 받기 위해 하루 종일 고달픈 노동을 감내해온 이들이 그나마 있던 일거리조차 사라져 이제는 하루하루 `목구멍에 풀칠할'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A인력소개소를 18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모(47) 실장은 "이런 불황은 처음"이라며 "작년만 해도 하루에 적어도 30∼40건씩 일감이 들어왔지만, 이번 달에는 파견한 일용 노동자가 전부 10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건물을 지어도 분양조차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건설업체들이 신규 공사를 대폭 축소했고, 덩달아 전기와 도배 등 하청업체의 일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이날 새벽 남구로역 인근의 또 다른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박모(50)씨는 설날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도무지 기분이 나지 않는다며 손사레를 쳤다.
박씨는 "올해들어 며칠째 인력사무소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번번히 허탕만 쳤다"며 "그래도 설날인데 자식들 볼 면목이 없어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하소연했다.
고향이 경북 김천이라는 김모(48)씨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힘든 처지에 부모님 뵙기가 송구스러워 고향에 갈 수도 없다"며 "올해엔 더 바랄 것도 없이 안정적인 직장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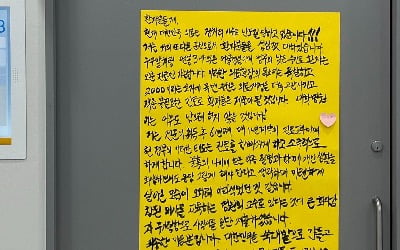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