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아리 귀신, 보는 이의 마음까지 순백으로 물들이다
"내 예술은 하나 변하지가 않았소.여전히 항아리를 그리고 있는데 이러다간 종생 항아리 귀신이 될 것 같소."수화 김환기가 친구에게 쓴 편지 구절이다. 스스로 '항아리 귀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항아리에 빠져 산 화가. 단순히 백자가 예뻐 그토록 모질게 그리지는 않았을 터이다. 한이라고나 할까,뭔가 끊으려고 해야 끊을 수 없는 질긴 연(緣)이 있었기에 그런 '항아리 귀신'이 된 게 아닐까.
수화의 예술은 한마디로 달항아리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예술은 어질다. 욕심이 없고 순수하다. 원만하다. 너르다. 담박하다. 쌀밥처럼 씹을수록 감칠맛이 난다. 이런 특질은 백의민족의 성정과 한가지로 닮은 것이다.
그러니까 달항아리는 우리의 성정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수화가 항아리 귀신이 되도록 달항아리를 사랑한 것은.한이 일 정도로 달항아리를 좋아한 것은.
그 사랑이 치열했던 까닭에 수화는 스스로 달항아리를 좋아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달항아리를 사랑하기를 바랐다. 사람들이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에 무심할 때는 섭섭하고 통탄해 하곤했다.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일단을 수화가 쓴 아래의 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항아리 값을 깎아서 사 본 적이 없다. 장사꾼이 부르는 값이란 내가 좋아하는 그 항아리 값보다 훨씬 싸기만 했다. 부르는 대로 사고 난 내 심경은 항상 횡재한 생각뿐이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사지 않나 싶어 민족에 대한 원한 같은 마음으로 마구 사들였는지도 모른다. "
아무리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훌륭한 우리 문화유산을 외면하는 게 한이 되어 가슴에 맺혔다. 그럴수록 그는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을 더욱 절절히 수놓았다. 꼭 항아리 그림뿐 아니라 모든 그림에 그는 그 아름다움을 핵심적인 미학으로 깔아놓았다.
'항아리와 여인들'은 그의 이와 같은 미적 특질이 잘 표현된 그림이다. 전쟁 중에 그렸는 데도 불구하고 그림은 매우 평화롭고 고즈넉해 보인다. 현실을 외면해서라기보다는 평화와 행복에 대한 염원이 간절해 이런 이상향이 그려진 것이라 하겠다.
화면은 수평으로 크게 삼등분 되어 있다. 하늘과 바다,그리고 뭍이다. 오른편으로 네 명의 여인이 항아리를 이거나 안고 오고 있고 왼편으로 두 명의 여인이 서로 어깨를 겯고 있다.
사람의 크기와 숫자도 대비가 되지만,무엇보다 동작이 대비가 된다. 오른편의 여인들은 이동을 하고 있고 왼편의 여인들은 가만히 서 있다. 전자는 무언가를 성취한 듯한 표정인 반면 후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다.
항아리를 이고 오는 여인들은 항아리에 무언가를 채워 오는 것일까? 그래서 저리 넉넉해 보이는 걸까? 항아리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든 그렇지 않든 항아리는 여인들의 행위와 감정,생각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것이다. 삶이다. 그래서 저리도 소중하게 이고 안고 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얼과 넋,전통,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보듬고 있을까? 저들처럼 귀한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일까? 제아무리 고통스러운 환란의 때라 하더라도 지킬 것을 지키고 소중히 할 것을 소중히 한다면 새로운 평화와 행복을 건설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지랄까,염원이랄까,전쟁 중임에도 백의민족의 앞날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화가의 시선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다가온다.
'항아리와 매화가지'는 사람은 빼고 항아리에 더욱 집중한 그림이다. 선들이 교차하면서 형성된 추상적인 바탕을 배경으로 달항아리가 두둥실 떴다. 그 일부를 매화가지가 가려 시적 정조를 자아낸다. 그 정조가 관객의 마음 밑바닥에서 한국적 성정의 원형질을 자극한다. 노년에 파리와 뉴욕에서 예술혼을 불태웠음에도 수화가 왜 그리 수미일관 한국적인 정서로 충만했는지 이로써 알 수 있다. 남산에 뜬 보름달처럼 그의 마음에 뜬 달항아리가 그의 정체성을 영원히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김환기의 달항아리를 보는 한국인들은 영혼과 세포까지 은은한 백의민족의 빛으로 물들게 된다. 이들 작품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갤러리현대 강남점에서 열리는 '화가와 달항아리전'(2월10일까지)에서 만날 수 있다.
/이주헌 미술평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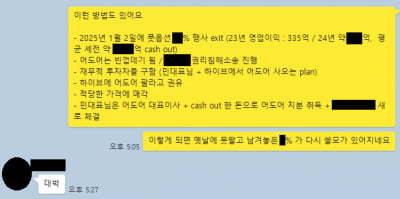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