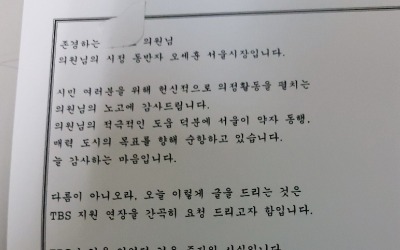입력2006.04.03 11:23
수정2006.04.03 11:25
일제에 징용됐다 숨진 한국인의 유골을 관리하던 일본 기업이 주소파악이 가능한 유족들에게 조차 연락하지 않은 채 유골을 제멋대로 합장(合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유골을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혜경(44.여) 박사는 24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한 사찰에 안치돼 있던 징용한국인 등의 유골을 관리하던 지사키(地崎)공업이 유골의 연고자를 알 수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정 박사는 지사키공업은 자사 공장 등에서 일하다 숨진 징용 한국인 등 101명의유골을 패전후 니시혼간지(西本願寺)의 삿포로(札幌) 별원에 맡겨 보관해오다 97년10월 사찰측에 요청, 각각의 유골을 나무상자 1개에 담아 합장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유골을 합장한 이유는 관리상 편의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정 박사가 일본 홋카이도 소재 시민단체인 `유골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관련 증거자료에는 지사키공업이 유골과 함께 사찰에 맡겼던 `유골유류품정리부'도 포함돼 있다.
이 자료에는 유골이 된 사망자 101명중 한국인 69명의 이름과 사망일시, 한국내본적, 근무기업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본적이 표기되지 않은 나머지 32명도 이름 등으로 미뤄볼때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제시대말기 홋카이도에서는 징용 한국인 20만명 정도가 탄광, 토목공사장 등에서 '다코베야(문어방)'라고 불리는 지하토굴에 갇혀 노역에 종사했으며, 상당수는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사고 등으로 희생됐다.
정 박사는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유골을 합장한 것은 희생자들을 두번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족들을 찾아내 해당 기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묻는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