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03
수정2006.04.02 21:05
90년대초 혈우병환자들이 에이즈 감염 혈액으로 만든 치료제를 맞고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논란이 재연되면서 당시 '사기매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중단된 경위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지검 서부지청 소속 수사 관계자들은 관련 질문에 '노코멘트'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수사 관계자들도 일부 매혈자가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져 이들이 매혈한 시점을 전후로 제조된 혈액제제를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검찰 내부에서 있었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당시 수사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매혈자 중 5명 가량이 에이즈감염자로 밝혀져 이들의 매혈기록을 추적한 결과 2명이 30-40차례 피를 판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매혈한 뒤 일정기간에 제조된 혈액제재를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품 폐기를 보건당국에 건의했나'는 질문에 "당시 직위가 높지 않아 보건당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도 힘들었다"며 즉답을 피해 수사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당시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진 2명은 사창가 등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됐으며,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자 혈액원 창고에 있는 장부를 통해 매혈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감염환자들이 판 혈액으로 만든 약품 제조번호에 대한 추적을 시도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수사관계자는 "문제의 약품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일부 언론은 한 수사관계자가 "에이즈 감염자들의 피가 제약사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확대와 해당 혈액 전량폐기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당시 검찰은 피를 팔러오는 사람들에게 1회 채혈량인 500㏄보다 60㏄ 많은 560㏄의 피를 몰래 뽑거나 72시간내 재매혈금지 규정을 어긴 제약사 산하 혈액원장 등 4명을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확대에 따른 헌혈급감과 에이즈 공포 확산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게 아니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제약사 로비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 수사팀 멤버는 "회한이 많이 남았던 수사였다"고 여운을 남긴 뒤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
![어디서나 환영받는 스타벅스?…"악몽입니다" 주민들 '호소'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415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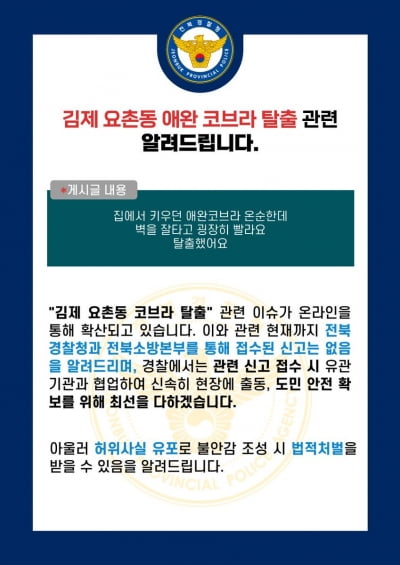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