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2:34
수정2006.04.02 12:35
남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한창인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감독은 작전타임을 부르고 선수들을 불러모았다.
선수들은 온몸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감독이 펼쳐 놓은 작전판에 집중하고 있다.
팽팽한 경기에서 오는 긴장감,선수들의 거친 숨소리,땀 흘린 몸에서 뿜어나오는 열기.이 거친 남자들의 세계를 파고드는 한 여자가 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어깨엔 카메라를 메고 이들의 심장박동까지 잡아내려는 듯 작전 타임의 순간 순간을 렌즈 속에 담아낸다.
KBS의 촬영기사 가운데 최초의 여성인 오난향(32)씨.1백70cm의 훤칠한 키를 자랑하는 오 씨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방송 카메라 작업을 9년째 하고 있다.
그녀가 지난 94년 입사했을 땐 턱 밑이 푸릇푸릇한 선배들이 "남자도 힘들어하는 세계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하는 분위기였다고.하지만 지금 오 씨를 보는 주변의 시각은 정반대다.
"처음엔 체력이 가장 걱정됐어요.
밤샘도 잦고 야외에 나가 있는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 체력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 보다도 강하더라구요.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해내고 있어요.
게다가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던 ENG카메라도 그냥 몸의 일부 같아요"
오 씨는 현재 중계 방송용 카메라를 맡고 있다.
뉴스와 스포츠를 취재하는 카메라 기자와는 달리 카메라맨은 보통 각종 운동경기와 행사를 중계하거나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의 스튜디오 촬영을 맡는다.
오 씨 역시 스튜디오와 중계 촬영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여느 남자들처럼 고생을 많이 했다.
"처음 드라마 촬영할 때 대본을 보면서 찍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날 촬영땐 샷의 종류와 순서를 모두 외우고 들어갔죠.그런데 출연자가 갑자기 즉흥연기를 펼치는 바람에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여기저기서 질책하는 말이 들려오는데 머릿속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눈 앞이 캄캄해지더라구요"
중계 촬영에 들어가서도 오 씨는 잊지 못할 고생을 했다.
"지난 99년 국제스키대회를 중계하기 위해 용평스키장에 갔어요.
경기장 코스가 급해지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사방 팔방에서 차디 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난생 처음 겪는 추위와 싸우며 혼자서 몇시간씩 촬영했죠.그런데 더 큰 문제는 촬영이 끝나고서였어요.
스키에 익숙치 못해 촬영지부터 숙소까지 홀로 눈밭을 걸어가는데 40분도 넘게 걸렸어요.
어찌나 서럽던지,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고..."
때론 여자라는 게 장점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큰 건 가끔 있는 여탕 촬영.수많은 카메라맨들이 욕심을 내는 대목이지만 오 씨가 버티고 있는 한은 여탕 촬영은 오씨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실제 여탕 촬영은 어느 정도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 씨가 주로 찍는다.
지난 98년엔 보도국 업무를 위해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찍으러 간 적이 있다.
몰래 카메라를 갖고 지하철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데 성추행 장면 뿐 아니라 소매치기 장면까지 촬영했다.
덕분에 KBS 보도국은 예상치 못했던 뉴스를 얻게 됐다.
오 씨는 "때론 여성의 섬세한 감각을 살려 꼼꼼하고 빈틈없게 찍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8년여 카메라를 앞을 지켜온 오 씨가 뽑은 "포토제닉(사진찍었을 때 잘 나오는 사람)"은 탤런트 전도연과 이영애다.
전도연은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오고 이영애는 그냥 너무 예쁘다는 것.오 씨는 자신이 찍은 드라마 중 "첫사랑" "한명회" "바람은 불어도" 등이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를 나온 오 씨는 일 뿐 아니라 자기계발에도 남보다 앞서 있다.
비교적 촬영계획이 일정한 오락 프로그램의 스튜디오 촬영을 맡은 지난 99년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 진학,영상매체를 전공해 석사학위를 땄다.
오 씨는 요즘 회사 다니는 즐거움이 하나 더 생겼다.
지난해 여자 후배 최정원 씨를 받은 것.그는 "8년동안 여자 후배가 들어오지 않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며 "요즘엔 짬이 나면 정원이와 떡볶이 집에도 가고 쇼핑도 한다"고 말했다.
아직 미혼인 그녀는 3~4년쯤 뒤 일에 더 자신이 생기면 결혼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남자 일과 여자 일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별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저는 앞으로 20년은 더 카메라를 들고 다닐 생각입니다"
길 덕 기자 duk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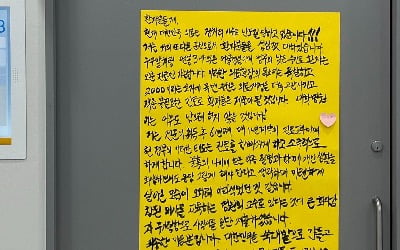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