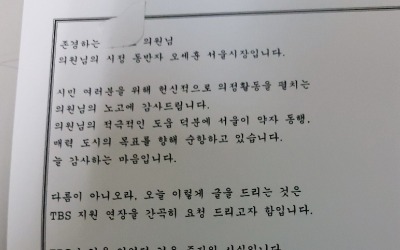입력2006.04.01 23:23
수정2006.04.01 23:25
최근 서울지역의 폭우 피해가 컸던데에는 엄청난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린 이유가 크지만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리지 않았거나 늦게 통보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 직원 등 현장인원을 늘리고 주민대피용 비상망 체계를 보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폭우 폭설 등 각종 재해 발생을 주민들에게 긴급 통보하기위해 지난달까지 11개 구청에 설치된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이번 집중호우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스템은 구청 당직자가 재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 버튼을 눌러 "여기는 구청입니다.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우려되니 빨리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녹음된 내용을 16~20회선씩 주민자치센터나 통.반장 집의 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전달하는 것.
그러나 동대문 중랑 영등포 양천구 등의 경우 수천 가구가 침수되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은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다만 은평 성북 도봉 노원구 등은 일부 통.반장에게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무소 기능 축소로 직원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점도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4일과 15일 집중호우가 퍼부을 당시 자치구마다 수방 관련 부서 직원들이 전원 자리를 지키고 동사무소도 전체 직원의 반이 나와 비상근무를 했다.
그러나 국지적인 호우피해를 즉각 파악할수 있는 동사무소의 경우 정작 인력 부족으로 피해를 줄이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관내 한 동사무소의 직원 수는 지난 98년 21명에서 현재 11명으로 줄었다"며 "몇몇 동사무소 직원들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15일 새벽 골목길을 누비면서 메가폰으로 대피를 알렸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