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멈춘 시계가 말하길
그 부장은 내게 어느 지역구를 지정해 주며 관람기를 써달라고 정중한 어조로 부탁했다.
두어번 내 완곡한 거절 후에 그가 말했다.
"사실, 작가나 교수 등의 지식인들이 정치에 냉소적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말에 나는 결국 꼼짝없이 그 분의 제의를 수락하고야 말았다.
냉소적인 지식인 전체를 대표해서 반성하는 기분으로. 합동 유세장은 이따금 뉴스에서 보아온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네명의 후보자는 저마다 자기를 뽑는 것만이 이 지역구, 이 나라가 살길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특히 그중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왜곡된 길을 갈뻔 했는지를 실증을 들어 누누이 강조하기도 했다.
애석하게도 나란히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미끄럼틀,혹은 정글집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의 충정을 헤아려 주는 것 같지 않았다.
첫번째 연설이 끝났을 때 3분의1이,그리고 두번째 후보자의 연설이 끝나자 남은 절반의 청중이 빠져나갔다.
마지막까지 그 나마의 청중이 남아있었던 것은 순전히 여당 후보의 연설 순서가 맨 나중이었던 덕분이었다.
인기 절정 드라마의 한 인물을 표방한 네번째 후보자의 지지자 두 사람이 푸른 관복 차림으로 따가운 햇살,풀풀 날리는 먼지 바람 속에 서 있는 광경은 거의 희극적이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어서 끝났으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오직 한사람, 교문 입구에서 커피와 음료를 파는 아줌마만 빼고-. 문득 교사 한가운데 걸린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시계는 4시50분을 가리킨 채 멎어있었다.
그 시계는 이제 새벽이 올 것인지, 어둠이 내릴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돌아가 프로농구 결승전 볼 생각에 마음이 바빴던 나는 조금 부끄러웠다.
남은 연설을 경청하기 위해 나는 사람들을 제치고 연단 앞쪽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소설가 서하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어디서나 환영받는 스타벅스?…용인 고기동에선 '악몽'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415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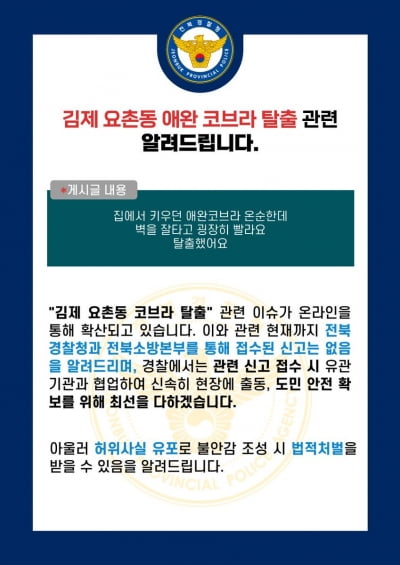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