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얘기 나오자마자 삽시간에 1000가구 늘어난 곳 [집코노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월 2차 선정…후보지 47곳 건축허가 전수조사
"뒷북 대책에 투기바람"…분양자격 못 받을 수도
"뒷북 대책에 투기바람"…분양자격 못 받을 수도

‘지분 쪼개기’ 바람
27일 집코노미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47곳의 건축허가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 99건의 빌라 등 다세대주택 신축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한 채당 10가구 안팎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총 1000가구 정도 불어난 셈이다.![재개발 얘기 나오자마자 삽시간에 1000가구 늘어난 곳 [집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159538.1.jpg)
건축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동구 고덕동 옛 고덕1구역(고덕동 501 일대)이다. 모두 11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과거 단독주택재건축구역으로 묶였다가 해제된 곳이다. 주변에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와 ‘고덕그라시움’ 등 재건축 아파트가 줄지어 입주하자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도입을 발표한 이후 지분 쪼개기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6 대책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후보지역들의 빌라 건축허가는 지난해 1~4월 25건에서 5~8월 27건, 9~12월엔 47건으로 증가했다. 장위동 A공인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도를 고려하다 공공재개발이란 선택지까지 생기면 빌라는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 얘기 나오자마자 삽시간에 1000가구 늘어난 곳 [집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159539.1.jpg)
40%는 청산 위험
문제는 ‘지분 쪼개기 금지일’의 개념인 권리산정일이다.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구역지정을 받는 지역의 권리산정일은 지난해 9월 21일이다. 정부가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 날이다. 일반 재개발구역이라면 구역지정이 이뤄지는 시점에 권리산정일이 함께 고시된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은 언제 구역지정을 받게 되든 후보지 공모일로 권리산정일이 앞당겨진다.2차 후보지 47곳의 건축허가 99건 가운데 40건은 허가 시점이 지난해 9월 21일 이후다. 신축 빌라의 40%가량은 매수하더라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자칫 대량 청산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성북동 B공인 관계자는 “허가는 사전에 받았지만 준공이 9월 21일 이후”라며 “경과조치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매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카페 대표는 “시장이 한껏 달궈진 상황에서 뒤늦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섣부른 투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지정되는 구역의 조합 정관을 변경해 원주민이 아닌 승계조합원들의 분양가를 높일 계획이다.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분양가가 아닌 주변 시세대로 새 아파트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입주권 투자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소장은 “입주권을 승계하려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중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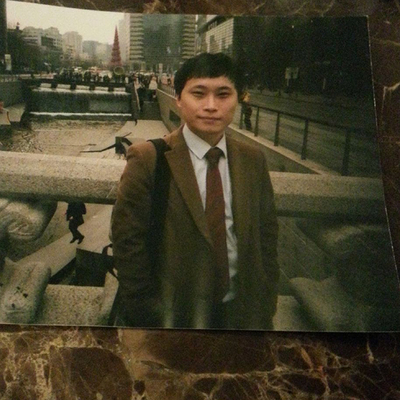

![집값 2023년부터 떨어진다?…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162283.3.png)
![[단독] 서울시 재개발 기준 완화 만지작…700여개 구역 개발 가능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159302.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