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시행사의 자신감… 상권 활성화한 뒤 분양
준공 후 3년 간 운영·관리
유동인구 넘치자 매각 나서
선분양 후 '나몰라라' 관행 제동
김포·세종서도 상권부터 활성화

◆준공 3년 후 분양

공실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곤 인근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와 다를 게 없다. 수백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배후 수요로 삼는다. 인천지하철 역세권이란 특징도 공유한다. 그럼에도 유독 이 상가만 활성화돼 있다.
이 회사는 후분양이 기본 원칙이다.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공급한 주상복합 상가도 절반 정도 보유하면서 전체 상권을 활성화했다. 또 이달 입주하는 ‘세종시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60여 개 중 65개도 팔지 않고 있다. 달성하기 어려운 장밋빛 수익률을 내세워 선분양한 뒤 나몰라라 하는 국내 개발 풍토와는 완전히 다르다.
장수영 오시아홀딩스 대표는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선 디벨로퍼가 개발한 상가를 장기 보유하거나 완전히 활성화한 뒤 매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후분양을 통해 디벨로퍼는 더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고, 상가 매입자는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는 상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고객 고려한 설계
오시아홀딩스는 분양 시점에 송도 상가가 공급과잉 상태라고 판단했다. 상권 활성화에 실패하는 곳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봤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설계부터 차별화했다. 접근성과 가시성이 높은 스트리트형 상가로 설계했다. 2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총 11대 엘리베이터를 상가 곳곳에 배치했다. 이 중 2대는 1~2층 전용 ‘누드 엘리베이터’다. 2층 활성화에 실패하는 상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설계다.
개방감을 주기 위해 천장고도 높였다. 천장고를 1층 6.3m, 2층 4.7m로 바꿨다. 당초 계획했던 높이는 1층 4.8m, 2층 3.1m였다. 2층 상가엔 테라스를 덤으로 제공했다. 장 대표는 “2층이 슬럼화돼 있는 주변 상가들과 달리 2층이 더 활성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시아홀딩스는 전략적으로 전용면적 670㎡ 규모 수입차 매장을 입점시켰다. 작은 점포 11개를 터서 만든 공간이다. 인근에서 보기 드문 매장이다 보니 주변 거주민들 사이에서 랜드마크가 됐다. 상가 인지도가 높아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임차인 니즈에 맞춰 공간을 탄력적으로 배정했다. 2~3칸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많아 준공 초 147실이던 점포 수가 67실로 줄었다. 임대계약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다. 영업기간을 최소 5년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인테리어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기간이다. 이철행 오시아홀딩스 상무는 “준공 후 2년 이상 직접 상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결과물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꼭 필요한 업종이라면 임차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기도 했다. 예컨대 어떤 프랜차이즈업체는 본사 방침이라며 임대 계약 전 질권 설정을 요구했다. 보증금을 내되 임대인이 어떤 식으로든 사용할 수 없게 묶어놓는 돈이다. 시행사로선 수억원 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에만 만족해야 했다. 은행 등 꼭 필요한 업종이 임대료 일부를 내려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단지 상권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였다. 장 대표는 “상가는 결국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느냐의 싸움”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시행사의 엠디(MD) 파워”라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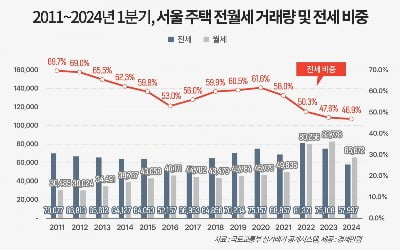




!["14억이 전기차 타야하는데"…인도, 리튬·니켈 확보전 뛰어든다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06152.1.jpg)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