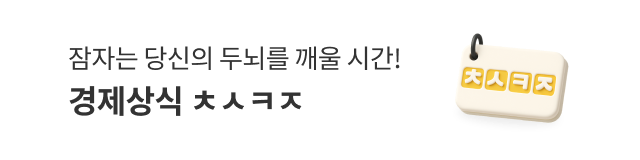수석실마다 1급 비서관 신설
비서관 등 수십명 증원 추진
올해 예산도 898억 역대 최고
"국정운영 靑독주 우려" 목소리
◆수석실마다 1급 비서관 추가
28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수석실마다 총괄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업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실행 비서관만 있는데 각 수석실에 업무를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비서관을 두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8개 수석실 산하 8개의 비서관 자리가 생긴다.
비서관실 한 곳에 6~7명의 행정관을 두는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 인원을 50명 이상 충원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실마다 인력 충원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비서관이 대거 신설되면 공무원 충원으로 인한 ‘큰 정부’ 등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균형발전비서관, 자치분권비서관 등 기능이 비슷한 비서관을 통폐합하는 대신 정책 분야 비서관을 신설할 가능성도 높다. 국무조정 역할을 하는 수석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백악관보다 몸집 커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의 힘이 세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예산(경호실 예산 제외)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880억원이었던 청와대 예산은 올해 898억원으로 확대됐다.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16년 예산(890억원)보다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산이 늘어난 것은 1인당 인건비 등 자연 증가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은 청와대’를 약속했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규모인 443명(비서실 기준)을 유지했다. 이는 377명인 백악관 비서실 인원 수(2017년 기준)와 비교해도 17.5%(66명)나 많다. 한국 중앙정부 공무원 수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수를 고려하면 청와대 몸집은 백악관보다 두 배 이상 큰 셈이다.
◆“청와대 몸집 축소해야” 비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각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안정화시켜야 할 집권 2년차에 오히려 조직을 키워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 끌어안으면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가 행정부를 들러리로 세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 작업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개헌안 발표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청와대에서 정책 방향은 물론 구체적인 목표 숫자까지 정해서 부처에 ‘배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부처의 정책 기획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국정운영이 내각이 아니라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청와대 수석·보좌관이 부처 장관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청와대 권한을 키워온 건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대통령 보좌와 정책 조정이라는 청와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미현/김우섭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