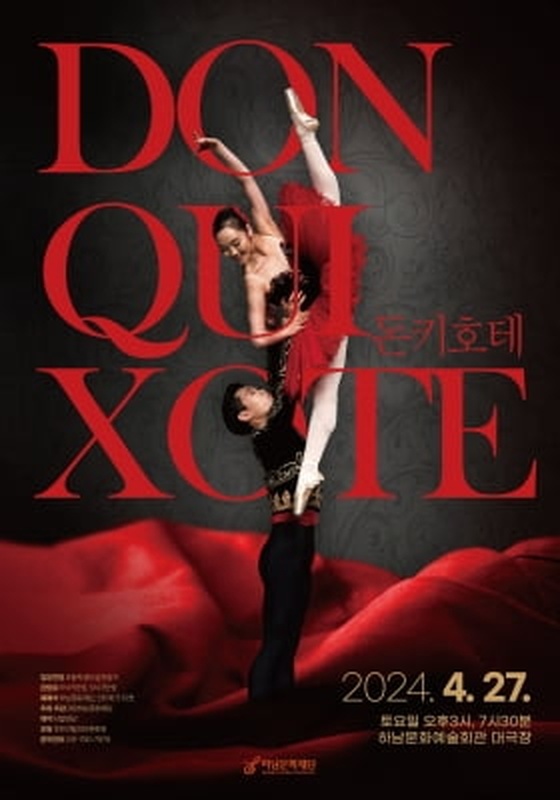'사지 잘리고 외통수 몰린' 유승민, 사즉생 결단 내리나
劉, 낙천시 탈당 무소속 출마 유력…공천 때도 정치행로 고심할 듯
"내 목 쳐달라" '국회법 파동' 당시 거취 논란과 유사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을·3선) 의원의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유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주일이다.
4·13 총선 후보자 등록은 오는 25일 마감되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당 공천자 대회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최대한 늦추더라도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는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유 의원 지역구에 대한 공천심사를 마쳐야 한다.
유 의원의 정치적 행로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만,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공'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에 가 있는 상태이다.
당 지도부가 가부간 공천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유 의원은 그 '공'을 넘겨받아
향후 정치 행로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 구도로 보면 유 의원은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탈당이 불가피한 '외통수'에 몰렸다는 관측도 있고, 우여곡절끝에 경선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선거전에 참여해 향후 당내 투쟁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교차한다.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공관위는 크게 3가지 수를 둘 수 있다.
정치적으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선택지는 유 의원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정하는 것이다.
11명의 공관위원 사이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다고 한다.
친박(친박근혜)계 입장에선 유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
이 경우 유 의원은 경선에서 경쟁자인 이재만 예비후보에 승리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조해진·이종훈·김희국·류성걸 등 이른바 '유승민 사단'으로 불리는 측근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 사실상 팔·다리가 모두 잘린 '산 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공관위가 유 의원을 단수 후보로 추천, 그의 손에 공천장을 쥐어주더라도 탈당을 결행하는 시나리오도 가정할 수 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 유 의원의 성정을 고려할 때 그럴 수 있다는게 주변의 분석이다.
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유 의원의 스타일에 비춰 경선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당당히 경선에 참여하고, 또는 단수추천으로 공천장을 받을 경우 새누리당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고 총선후까지 내다보며 당내 비주류로서 정치적 미래를 설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관위가 유 의원을 단수추천하는 시나리오는 "당 정체성과 관련해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이한구 위원장의 원칙을 깬다는 부담이 따른다.
때문에 이 위원장이 이런 원칙을 고수하면서 유 의원의 낙천을 강행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으로선 이번 총선에서 일정 부분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당 지도부 역시 '역풍'을 우려해 쉽사리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관위가 결정한 후 최고위가 수용 여부를 정하는 절차적 문제도 있지만,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당으로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유 의원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내심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이 위원장의 고민이다.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탈당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 의원 입장에선 공관위의 결정에 앞서 탈당하는 게 '자충수'일 수 있다.
그의 '칩거 모드'가 길어지는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원내대표 사퇴 국면에서처럼 "내 목을 쳐달라"는 유 의원과, "알아서 나가라"는 이 위원장이 '초읽기' 수 싸움을 벌이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천 국면은 지난해 '국회법 파동' 당시의 유 의원의 거취 문제와 상당부분 닮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유 의원은) 자신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 자신의 행동과 거취가 정치 발전이나 나라 발전에 어떻게 기여될 것인가, 그 고민만 갖고 씨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며 "그 연장선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이재명, 尹대통령에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 돼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26473.3.jpg)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