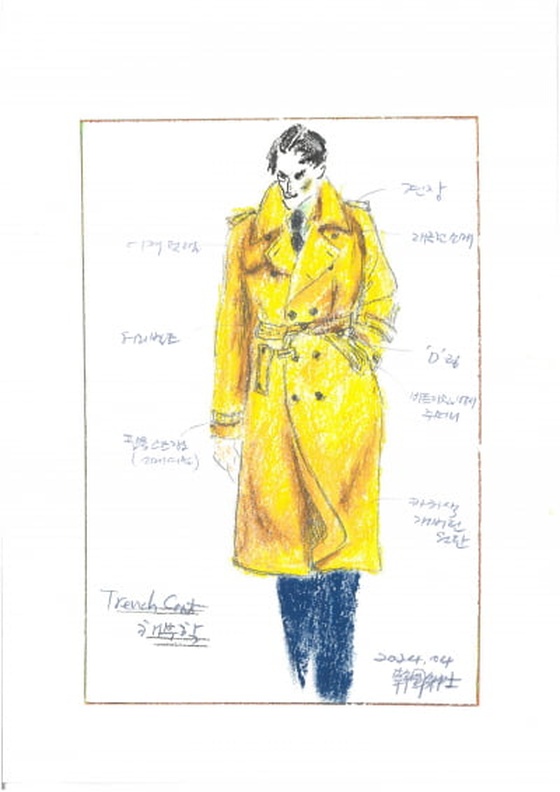[검찰, 최시중 거액수수 수사] 인·허가 압박 여부가 핵심
총 사업비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기존 화물터미널에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자연스레 인·허가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2003년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간 파이시티는 2005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대규모 점포 등 상업시설 입지가 허용됐다.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이 고시된 것은 2006년 5월이었다. 이후 두 차례 건축위원회를 거쳐 2008년 10월 말 ‘단지 내 각 동별 소방차량의 접근동선 확보’를 조건으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고, 2009년 11월에야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작부터 건축허가까지 5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인·허가를 빨리 받았다면 건설사 지급보증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아 대출을 갚고, 자산 선매각이나 분양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매일 수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파이시티 시행사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총 1조450억원에 이른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절차가 까다로운 용도 변경 과정에서 자금조달 압박에 시달린 시행사들이 불법적인 방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행사 대표는 “특혜 논란에 시달릴 우려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자체에서 명확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해 사업 가능 유무를 빨리 결정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미·일 vs 북·중·러' 新냉전 시대 오나…각국은 '동상이몽' [지정학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3405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