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친박 '조기전대' 격돌…공염불로 끝난 쇄신
박희태 대표의 거취 문제도 논란거리였다. 친이-친박 간은 물론이고 친이계 내부에서도 소그룹별로 '셈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한 쇄신특위는 사실상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친이계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당 쇄신을 위해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아예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 측에 당권을 맡겨보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지금으로선 민심 수습이 우선인데 마치 조기 전대를 통하지 않으면 쇄신이 아닌 것처럼 몰고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정무라인이 이미 박 대표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조기 전대 논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중립 성향의 한 의원은 "현 지도부 유임 쪽으로 (청와대에서) 전화를 돌렸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청와대가 반대하면 맥빠진 소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희룡 쇄신위원장은 지도부 퇴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쇄신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측근들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번 주 말 구상 뒤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지만 자진 사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차기현/김유미 기자 khch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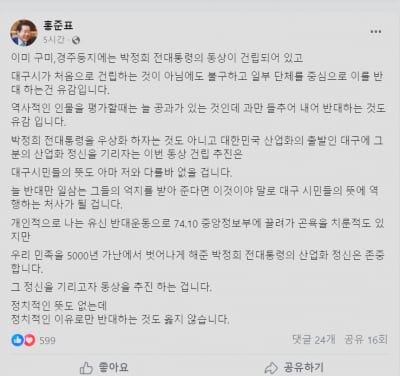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N.36524086.3.jpg)











![[신간] 당뇨·심장병·암·치매 예방하기…'질병 해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2518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