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은행은 사치재가 아니라 '인프라'다
생존·수익성 중요하지만 포기는 안돼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
![[기고] 지방은행은 사치재가 아니라 '인프라'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7.24219482.1.jpg)
외환위기 이전 10개 지방은행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6개만 남아 있다. 영호남과 제주에 국한된다. 그 지역만 특수한가? 지방은행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사치재인가? 20년째 외면받는 질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경기·충청·강원 지역의 은행 점포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에 합병돼 간판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에도 사실상 지방은행이 있는 셈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은행의 여신 활동은 지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1956년 실시된 은행 민영화 때 4대 재벌들이 시중은행을 소유한 뒤 은행 여신을 좌지우지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은산분리 원칙이다. 다른 사례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을 하나씩 차지하게 된 대형은행이 해당 지역에서 펼친 여신 활동은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금융위원회 ‘지역재평가 평가결과’).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삼은 대형은행이 특정 지역만 배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창구에 기댄다.
경영부실로 문을 닫은 지방은행을 이제 와서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생각인데, 설득력은 약하다.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는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지만, 끊어진 다리를 다시 세웠다. 새로 지은 다리를 서울시가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지방은행을 다시 설립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등장한 판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지방은행 모델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 예산으로 적자를 메워가고 있는 지방공항을 볼 때 그런 걱정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수익성과 생존가능성 때문에 지레 신설을 포기할 수는 없다. 쿠팡·마켓컬리·SSG닷컴 등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 기업들에 지레 겁을 먹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지방공항과 달리 지방은행은 설사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지방은행의 영업 환경은 척박하다. 현존하는 지방은행들조차 수익성과 성장성이 썩 밝지 않다. 신생 지방은행이라면 시중은행과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금고, 신협) 사이에 끼어서 훨씬 고전할 수 있다. 향토기업과 주민들에게 필사적으로 밀착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기존 상업은행의 점포를 인수하거나 자잘한 서민금융회사를 합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지방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승산이 있다.
지방은행은 사치재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다. 그것을 갖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권리다. 시중은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자본금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든 마련해서 지방은행을 세우겠다면, 정부가 막을 이유는 없다. 그것을 지방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한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기고] 탄소산업이 '그린·디지털 시대' 이끌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7.2904531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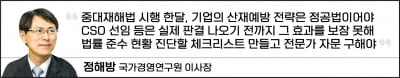
![[특별기고]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선두주자는 관광"](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AA.2900875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