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아이히만과 폭스바겐의 기술자들
![[한경데스크] 아이히만과 폭스바겐의 기술자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1/AA.11191083.1.jpg)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대중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이히만은 평범했고 개인적으론 유대인을 살해·학살할 동기가 충분치 않았다. 아이히만은 나치스, 즉 히틀러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히만은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지시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다.
악의 평범성, 그리고 폭스바겐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이 같은 ‘생각하지 않음’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량학살을 부추긴 것이라고 통찰했다. “생각하는 데 있어 무능력함, 특히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대한 무능력함이 죄의 근원”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9월 터져나와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아이히만을 떠올리게 한다. 폭스바겐은 2008년 포르쉐를 합병한 이후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가 되고자 했다. 비밀병기도 있었다. 디젤엔진이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연비는 높았다. 단 한 가지가 문제였다.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가솔린차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폭스바겐 최고경영진은 엔지니어그룹에 강하게 주문했다. 배출가스를 줄인 디젤엔진을 내놓으라고. 폭스바겐 엔지니어들은 노력했다. 하지만 기술 한계에 봉착했다. 이때 고안한 것이 조작 기술이다. 각국 환경당국이 자동차 환경 인증검사를 할 때 실험실에서만 검사를 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실험실에선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도록 했다. 물론 실제 도로에선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아 오염물이 많이 배출되도록 했다.
소비자 우선하는 문화 절실
폭스바겐의 눈속임은 성공할 뻔했다. 디젤차가 인기 없는 미국에서도 폭스바겐 디젤차는 상당히 팔렸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엔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영원히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사기(詐欺)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먼저 적발됐다. 폭스바겐 사태는 최고경영진이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하지만 아렌트의 시각을 빌리자면 엔지니어그룹도 죄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이 사기 소프트웨어를 보고하고 경영진이 이를 승인했다고 하면 그들의 죄는 면해지는 것인가. 전시체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면 죄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인가.
기업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은 ‘생각의 무능함’에서 머물러선 안 되며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기업의 구성원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박준동 산업부 차장 jdpowe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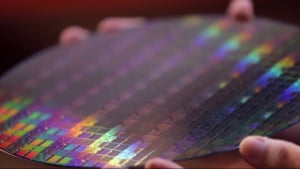
!["갈 길 멀지만…" 2년 만에 활짝 웃은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3223.3.jpg)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살인과 고문조차 서슴치 않았던 폐륜의 과학자와 의사들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205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