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기업이 氣살린 당진
작업복에는 '현대제철' '동부제강' '엠코' 등 철강·건설업체들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2년 전 이곳에 갈비집을 연 심연섭씨(49)는 "처음엔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장사하나 많이 걱정했다"며 "지금은 회식이 겹치면 자리가 없을 때도 많다"고 전했다.
근로자들뿐 아니라 이들을 따라 이주해온 가족들로 지역 전체가 젊어지고 있다.
노인들만 시골을 지키는 다른 시골 마을과는 영 딴 판이다.
인구 13만명의 충남 당진군은 현대제철 관련업체를 비롯 해마다 100개 이상의 기업이 터전을 옮겨오고 있고, 인구도 3000~4000명씩 유입되고 있다.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돼 산을 깎은 자리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 당진의 놀랄 만한 변신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충남인 부여군은 당진군을 늘 부러워한다고 한다.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럴 만했다.
부여는 면적이 624.6㎢로 당진(664.5㎢)과 유사하지만 인구는 7만8000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재정자립도,지방세수는 각각 당진의 40%,38%에 불과했다.
당진이 시골마을에서 '대처'로 바뀐 것은 전적으로 기업유치에서 비롯된다.
당진군은 지난해 105개의 기업을 유치했지만 부여군은 8개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기업유치가 지자체의 명암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이다.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당진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2011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가 본격 가동되면 당진이 울산,포항을 능가하는 기업도시가 될 것"이라고 꿈에 부풀어 있다.
'현대제철의 발전이 곧 당진의 발전'이라는 등식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
이렇다보니 당진군도 기업 '기(氣)살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이 주인이 되는 당진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당진군이 다른 지자체를 제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 낼지 궁금하다.
당진=송대섭 산업부 기자 dsso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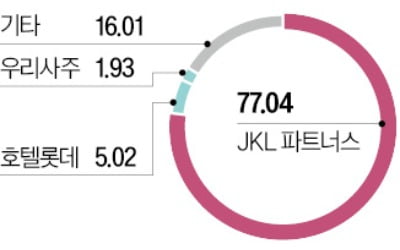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