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도인가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지도 모른다.
![[생글기자 코너]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도인가요](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01.17767994.1.jpg)
이 문구에 대한 예는 우리말이 대표적이다.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달라진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를 말하려다 “넌 얼굴만 예뻐”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것처럼 언어에는 나름대로 온도가 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지도 모른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른 예를 들자면 말도 의술이 될 수 있다.
병원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는 언어가 다른 곳보다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 특히 암 환자가 돌봄을 받는 병동에서는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환자를 부르는 호칭도 이런 현상에 포함된다. 팔순을 넘기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면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게 된다. 그리고 ‘환자’에서 환은 근심 환(患)이 쓰이는데 자꾸 환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항상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인식해 병이 악화되거나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언어 온도가 몇 도쯤 될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는 온기 있는 언어로 슬픔을 감싸 안아주거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낸다. 아니면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난다거나 나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 언어의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항상 쓰이는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깨닫고 각자의 언어 온도를 스스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언어는 한 사람의 인품이자 바로 그 사람이다. 말은 한 사람의 많은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양동수 생글기자(서일고 1년) didehdtn1201@naver.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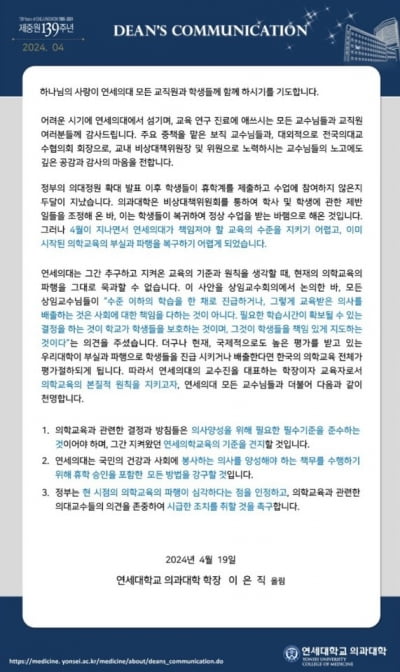
![[커버스토리] '알·테·쉬' 공습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401055.3.jpg)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라고/-라며' 구별해서 쓰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361165.3.jpg)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