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지난주 2016 임단협을 끝마쳤다.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350%에 추가 330만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영광(?)의 상처는 너무 컸다. 지난 7개월 동안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을 거부하며 생긴 생산차질 규모만 14만2,000여대, 3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대차의 상반기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물론 쟁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여론이 '귀족노조'의 배부른 어리광이라 핀잔을 줘도 그들만의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유의미한(?) 투쟁은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 외에 위치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 발표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입은 손실액은 3조1,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손실을 그대로 떠안으려는 기업은 결코 없다.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려 손실을 만회하려는 '손실 보전의 법칙'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납품 가격을 낮출 것이고,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때마침 현대차가 연말 그랜저(IG)라는 거물급 신차를 출시한다. 온 국민이 인정하는 현대차의 기둥이다. 지난 2011년 출시된 5세대(HG)는 6년 동안 국내 시장에 47만대 이상 판매됐다. 출시 첫해 연간 10만대를 돌파했고, 이후 매년 베스트셀링카에 이름을 올렸다. 존재감이 확실한 그랜저가 완전변경을 거쳐 6세대로 등장한다. 실내외 디자인부터 동력계까지 제네시스급의 상품성을 확보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그래서 국내 경쟁 차종도 딱히 꼽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기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다. 6세대 그랜저로 이익보전에 나서는 것이다. 완전변경을 거친 신차인 데다 절대적 인기가 뒤따르는 만큼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약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기업의 '손실 보전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소비 트렌드를 보면 시장의 '냉정함'이 적지 않게 읽힌다. 제 아무리 그랜저라도 소비자들이 무턱대고 구입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이미 노조파업에 따른 피로감도 높다. 반대로 현대차 입장에서 그랜저는 안방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인 차종이다. 수익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의 치열한 '이익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신형 그랜저는 신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최근 현대차에 대한 불편한(?) 여론이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할 수 있어서다. 소비자가 냉정하게 현대차를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차의 제품력이 불편한 여론을 잠재울 만한 수준에 올랐는지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랜저마저 외면 당한다면 불편한 여론이 사실상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현대차'가 여전히 시장에 통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과연 현대차는 지금 어떤 결정을 준비하고 있을까. 반전있는 시나리오를 기대해 본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기자파일]파업으로 잃은 '3조원', 그랜저로 찾을까](http://autotimes.hankyung.com/autotimesdata/images/photo/201610/969192dc89a1710c27d0d1e540f297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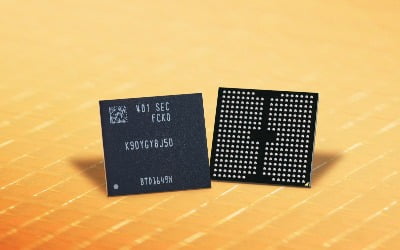









![[단독] 20代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9472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