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빵셔틀까지" 슈퍼甲 병원에 쩔쩔매는 제약사들
병원과 병원에 약을 납품하는 제약사들의 '검은 거래'는 케케묵은 이야기로 치부될 정도로 '뻔한 이야기'가 됐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이 알려졌고, 김영란법이 시행돼 전국이 떠들썩한 지금 이 순간에도 암암리에 자행되는 '악습'으로 남아 있다.
전북 '전주 J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슈퍼 갑인 병원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전주의 한 대형병원 이사장인 박모(60·여)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와 약 도매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28억여원에 달했다.
박씨가 전주에 정착한 것은 2005년으로, 28억여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2011년 이전 리베이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박씨가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은 교묘했고 한편으로는 노골적이고 당당했다.
그는 2014년 원래 운영하던 병원(300병상)의 분원(200병상)을 개원할 때 병원에서 쓰이는 집기 상당 부분을 제약사들로부터 '협찬'받았다.
이 병원에 들어간 복사기, TV, 컴퓨터, 책상 등 집기는 모두 2억원 상당이다.
이 중 5천여만원어치는 이 병원에 약을 납품하길 희망하는 19개 제약사에서 분담해 마련했다.
나머지 금액도 박씨가 운영하는 병원과 약 도매업체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말 그대로 병원을 새로 개원하면서 병원 집기를 장만하는데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에게는 '빵'을 사오라며 넌지시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박씨는 고향인 대구와 전주를 오가며 의료 사업체를 운영했다.
매주 한 차례 고향을 방문하는 박씨는 영업사원들에게 "전북의 특산물이 뭐냐? 군산에 빵이 유명하던데"라며 영업사원들을 은근히 압박했다.
골프장으로 휴가를 갈 때면 호텔 숙박을 예약해달라며 노골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 도매업체 관계자는 30명, 제약회사 관계자는 46명이다.
이 중에는 국내 굴지의 제약사 3∼4곳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지역에서 제법 규모가 큰 병원 두 곳을 운영하는 '슈퍼 갑'인 박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들어가는 돈이 우선 당장은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약값을 치르는 환자들이 모두 부담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을 마련해도 리베이트의 유혹에 빠진 병원과 제약사들의 악습을 뿌리 뽑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엘리뇨 가고 라니냐 온다…중미, 곡물 생산 차질 우려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928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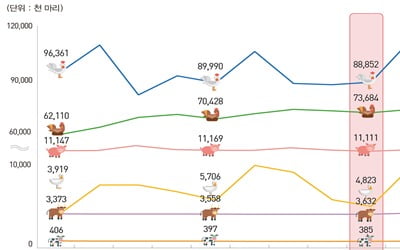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