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인희 서울대 의대 교수 "10년 후면 치매 걱정하지 않는 세상 올 것"

묵인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53·사진)는 22일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자를 다시 연구실로 돌려보내는 것보다 아예 연구실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묵 교수는 이날 로레알코리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이 공동 수여하는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학술진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04년 젊은 여성 생명과학자에게 주는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약진상을 받은 지 12년 만이다. 묵 교수는 “남성 과학자든 여성 과학자든 연구를 중간에 중단하는 건 연구자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며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실험실을 출퇴근하며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묵 교수는 국내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의 최고 권위자다. 서울대 동물학과(82학번)를 졸업하고, 1991년 미국 애리조나대 세포생물학 및 해부학과에서 신경과학을 전공, 시냅스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귀국한 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생성을 막는 치료제 및 진단법을 연구하고 있다. 2010년에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에 신약 후보 물질 기술을 이전하고, 국내 제약회사 종근당과도 상품화를 목표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묵 교수는 “10년 전만 해도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연구만 하고, 의사들은 별도로 치료 방법을 찾았지만 이제 의사와 과학자가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10년 새 연구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했다. 그는 인간이 알츠하이머병을 극복하거나 최소한 완화할 수 있는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세계적으로 임상 3상에 도달한 치료제 후보가 20종에 이릅니다. 제가 올해 53세예요. 알츠하이머병 위험 나이가 65세인데, 제가 그 나이가 되면 알츠하이머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고 했다. 국내 알츠하이머병 기초연구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내 과학계는 여전히 결과를 빨리 내는 쪽에 투자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다 보니 연구비가 없어 주제를 바꾸는 과학자가 많습니다.” 묵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에게 최고 경쟁력은 장시간 연구를 버텨낼 체력과 스트레스 관리”라며 “평소 여행이나 영화 감상 등 다른 활동을 통해 오랜 연구에도 지치지 않을 몸과 정신을 기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젊은 여성과학자에게 주는 ‘펠로십’ 수상자에는 김현경 서울대 연구조교수(34), 이정민 KAIST 연구조교수(36), 유남경 서울대 연구원(32)이 선정됐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어디서나 환영받는 스타벅스?…이 동네선 "악몽이 따로 없네"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415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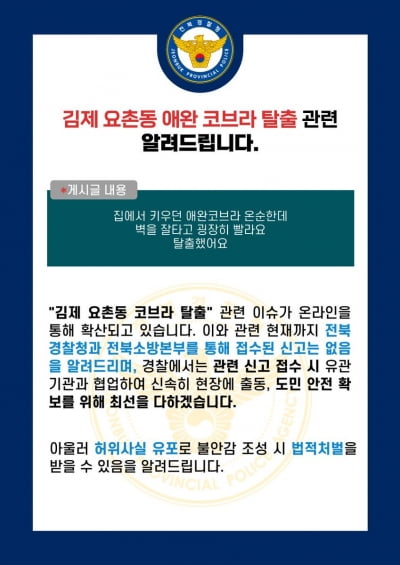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