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차기(~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및 효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중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와 효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연기하는 대안으로, 2020년에 ㎞당 온실가스가 97g 이하, 복합효율은 24.3㎞/ℓ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 2012~2015년 온실가스 140g/㎞, 복합효율 17.0㎞/ℓ보다 한층 엄격해진 기준이다. 또한 유럽의 91g/㎞(2021년), 일본의 100g/㎞(2020년), 미국의 113g/㎞(2020년) 등 해외 규제와 비교해도 까다롭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다. 현대기아자동차는 다양한 친환경차 출시로 강화된 기준을 충족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2020년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2위'를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카 12종,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6종, 전기차 2종, 수소연료전지차 2종 등 22개 제품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는 만큼 연료다변화가 가장 적합한 해법이라고 판단해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차체 경량화 관련 기술 연구에 앞장선다. 차체를 구성하는 소재의 무게를 낮춰 온실가스와 효율, 두 가지 문제에 모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준중형차인 SM3는 경쟁차종인 현대차 아반떼에 비해 약 20~25㎏, 쉐보레 크루즈(가솔린 기준)보다 165㎏ 가볍다. 일반적으로 차체 무게가 10% 줄면 효율은 3%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쌍용자동차는 한 발 늦은 친환경차 개발에 속력을 낸다. 지난 2009년 파업 이후 이익창출 위한 차종에 매진했던 만큼 앞으로는 환경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단 입장이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티볼리 EVR'이 시작이다. 전기모터와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조합한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로 최장 400㎞까지 주행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장기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처럼 각 사가 친환경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소비자 만족 외에 과징금 부담 때문이다. 만약 제조사가 2020년부터 판매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효율 평균치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초과 배출량 1g당 1만원을 기준으로 판매대수의 배수만큼 내도록 돼 있는데, g당 과징금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2020년 생산차종이 기준을 미달했더라도 곧바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을 두고 제조사 개선 의지와 감축 가능성 등을 판단해 이전 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 국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 기술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온실가스 및 효율 기준을 일괄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차종이나 연료 및 소재 특성별로 인센티브 등 가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체 실정에 맞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수입차 업계 반응은 반반이다.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까다롭거나 비슷한 유럽·일본의 경우 크게 걱정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한 미국 브랜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국내에서 연간 4,5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돌파구를 열어뒀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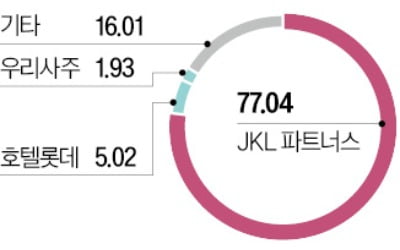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