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1분1초 다급한 심장병, 한 공간에서 통합진료"
박진식 이사장, 34년째 날마다 '의료진 회의'
꾸준한 연구로 의료수준 높여 베트남·중동에 병원 건립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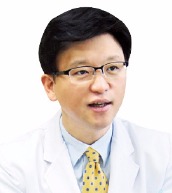
1981년 당시 한양대 의대 교수였던 박영관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회장이 서울대병원 부설 병원연구소를 찾았을 때다.
“한국 최초의 심장전문병원을 짓겠다”는 그의 말에 연구소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다. 심장 수술을 할 줄 아는 대학병원조차 드물던 시기였다. 개인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 회장은 자신 있었다. 독일 뒤셀도르프 의과대학에서 심장 수술 기술을 배워왔다. 수술받지 못한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국내에만 2만명이 넘었다. 생각이 같은 의사들을 모았다. 1982년 8월 경기 부천에 국내 첫 심장전문병원 문을 열었다. 환자가 몰려들었다. 3년 만에 병상을 100개에서 300개로 늘렸다.
34년이 지난 지금 세종병원은 여전히 국내에서 유일한 심장전문병원이다. 박 회장의 장남인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사진)은 “심장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한다”며 “뇌혈관 분야도 강화해 2020년까지 아시아 최고 심뇌혈관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병원은 심장사관학교로 불린다. 이 병원에서 배운 뒤 대학병원으로 간 의사가 100여명에 이른다. 선천성 심장병을 고치는 국내 대학병원 의료진은 대부분 이 병원 출신이다. 3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모닝 콘퍼런스’가 의사들을 키웠다. 매일 오전 심장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의 의사들이 모여 치료 방법을 고민한다. 과별 경계가 뚜렷한 의료계에서 여러 과가 모여 매일 회의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박 이사장은 “환자 입장에서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지 사심 없이 토론하는 자리”라며 “서로 환자를 데려가겠다고 욕심내지 않는 것이 30여년간 만들어진 문화”라고 설명했다.
연구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도 34년째 그대로다. 개원 초기 이 병원 의사들은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부검하며 심장병을 공부했다. 최근에는 각종 세미나와 논문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좋은 논문을 발표하면 상을 주고 연구비도 지원한다”며 “이 같은 노력은 한국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장병 환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10분 사이에 심장이 멎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세종병원은 이에 최적화돼 있다. 한 층에 수술실, 중환자실, 혈관조영실이 모두 있다. 공간을 분리해 써야 하는 대학병원보다 환자 치료에 유리하다. 320병상 규모에 직원이 800명이다. 한 병상당 직원이 한 명 정도인 다른 병원의 2.5배 규모다. 그만큼 환자를 꼼꼼히 볼 수 있다.
한 해 4000~5000명의 외국인 환자가 이 병원을 찾는다. 더 많은 해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지난해 자회사를 설립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클리닉을 열었다. 베트남, 중동, 러시아 등에도 병원을 지을 계획이다. 내년 3월 인천 계양구에도 새 병원이 문을 연다. 병원 내 안과는 한길안과병원에 맡겼다. 전문병원이 한 병원에 모여 각자의 파트를 진료하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처음 이뤄진 시도다.
박 이사장은 “안과, 정형외과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심장질환자가 많다”며 “우리가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려면 시간이 걸리니 이미 전문성을 갖춘 병원과 함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