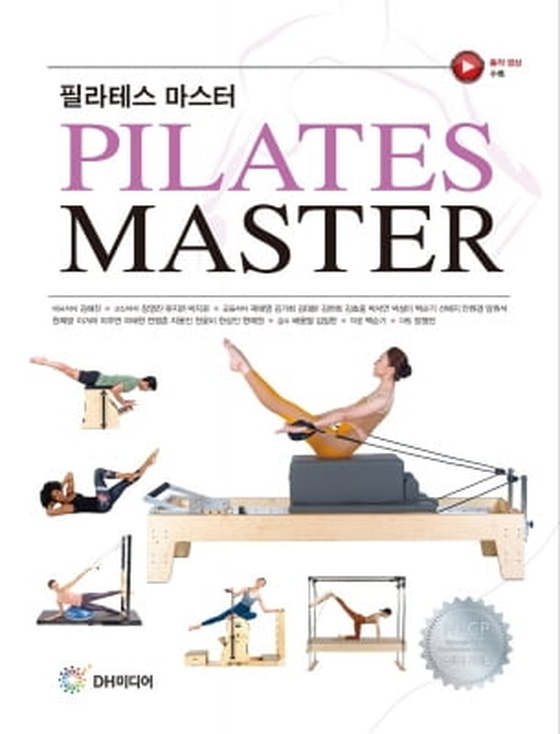[비즈&라이프] 일본 우량기업들의 추락은 '파괴적 혁신' 외면한 탓
일본 이노베이션의 딜레마
![[비즈&라이프] 일본 우량기업들의 추락은 '파괴적 혁신' 외면한 탓](https://img.hankyung.com/photo/201601/AA.11085605.1.jpg)
이 책은 파괴적인 혁신의 본질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일본 기업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다마다 ?페타(玉田俊平太) 간사이가쿠인대 경영전략연구과 부연구과장은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유명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제자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혁신에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존속적 혁신’과 기능을 단순화하거나 특정한 편리성을 높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파괴적 혁신’ 등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이런 혁신의 구조를 상세히 보여준 뒤 파괴적 혁신의 세 가지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기업도 이미 파괴적 혁신을 여러 차례 실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소니의 트랜지스터 TV, 캐논·후지필름·카시오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에 대해 기존 대기업은 종종 ‘합리적’ 결정을 고집한다고 지적한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파괴적인 혁신을 무시한다는 얘기다. 전형적인 실패 사례가 1870년대 전신회사인 웨스턴유니언이 그레이엄 벨의 전화 특허 매각 제안을 거절한 일이다. 당시 전화는 전보에 대한 파괴적인 혁신이었지만, 안정적인 전보 대신 단점 투성이의 전화를 채택할 이유가 없다고 웨스턴유니언은 판단한 것이다. 이 책은 파괴적 혁신의 목표인 무소비자(無消費者·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소비자)의 요구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파괴’하는 것이 ‘생존’이라고 강조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