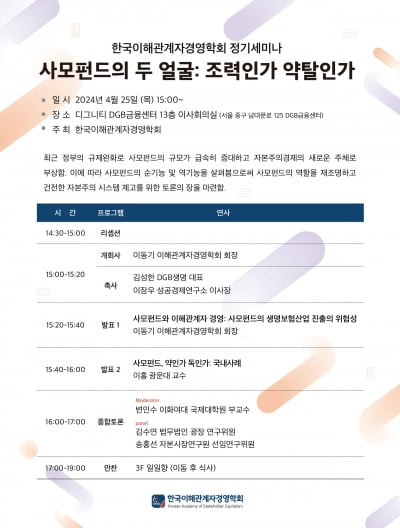"챙길 수 있는 건 多 챙기자"…떼법 조장하는 시민단체
만연한 지역이기주의
송전탑 건설 등 일단 반대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분쟁 부추겨

한국전력은 신설 예정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17㎞ 구간에 고압송전선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송전선이 용인과 안성 일부 지역을 지나도록 설계된 게 빌미가 됐다. 7월엔 안성 시민 1000여명이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전선을 둘러싼 평택과 안성, 용인 지역의 갈등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여파로 15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사업은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우주탐사 연구개발센터’를 경남 진주에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뒤 사천시의 강한 반발에 봉착했다.
사천 시민단체들은 “본사를 둔 사천에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영 간섭이 지나치다”며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역이기주의와 사람들을 동원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떼법’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한 요인이다. 지역에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민·관을 가릴 것 없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나선다.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념에 매몰된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의 제3자로 개입하면 분쟁지속 기간이 평균 194일, 분쟁 당사자로 개입하면 평균 522일 늘어났다. 2010년 9603개였던 시민단체 수는 지난해 1만2252개로 늘었다. 매년 약 500개가 새로 생겨난 것이다.
김태호/홍선표 기자 highkic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