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전자산업] 한국, 기형아 검사조차 中에 맡기는 '유전자산업 후진국'
장비 도입해도 심사까지 수년…유전자 분석 사실상 허가제 운영
외국서 일상화 된 당뇨·비만 검사…이중삼중 규제에 꿈도 못꿔
환자 유전자정보 유출도 심각…"치료제 개발 외국社 독점할 판"
![[위기의 유전자산업] 한국, 기형아 검사조차 中에 맡기는 '유전자산업 후진국'](https://img.hankyung.com/photo/201504/AA.9830196.1.jpg)
유전자 분석업체인 디엔에이링크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최근까지 2년여 동안 14차례나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신고했지만 “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내부 자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디엔에이링크가 신고한 TERT(폐암), TOX3(유방암), SORL1(치매), ADH1B(알코올 의존성) 등 질병 관련 유전자 20개 가운데 ADH1B 1개만 분석 서비스를 승인해줬다. 이종은 디엔에이링크 대표는 “질병관리본부에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신고제인 유전자 분석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유전자 산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유전자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 유전자 산업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기형아 검사도 막는 이중삼중 규제
‘니프티’ 검사는 다운증후군 등의 장애 유무를 유전자를 통해 미리 검사하는 서비스다. 기존 기형아 검사인 양수 검사보다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싸지만 임부 배에 바늘을 찔러 뽑아낸 양수로 기형아 검사를 하는 방식에 비해 안전성과 정확도가 높아 임신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업체들은 이 검사를 할 수 없다. 기술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유전자 분석장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기기법은 제조사가 제품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전자 분석기기는 미국 업체가 만든 제품이다. 미국 업체가 제품정보 노출을 감수하면서 국내에 의료기기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마크로젠 테라젠이텍스 등 관련 업체는 사들인 장비를 놀릴 수밖에 없다.
설령 외국 제조사가 제품등록을 해 허가를 받더라도 걸림돌이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 급여 항목인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태아 유전자 검사가 아닌 다른 유전자 검사는 더 까다롭다. 급여 항목 심사에 앞서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 기술에 대해 한 번 더 심사하는 과정이다. 최대 1년이 걸린다. 이 과정을 가까스로 통과하더라도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란 규제가 버티고 있다. 이 규제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 검사를 신고해도 거절당할 수 있다.
이러는 사이 중국 BGI와 미국 아리오사 등 해외 유전자 분석 기업들은 국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임부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 BGI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는 니프티 검사 대행업체인 휴먼패스의 이승재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중국에서 2500여건의 검사가 진행됐다”며 “올해 1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출되는 한국인 유전자 정보
전문가들은 한국인 유전자 정보가 해외 기업에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니프티 검사의 경우 검사업체가 임부와 태아의 유전자 정보를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는 벌써부터 유전자 정보 수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다국적 제약사 로슈는 암 유전자 분석 서비스 기업인 파운데이션메디슨을 8500억원에 인수했다. 파운데이션메디슨이 확보한 유전 정보를 암 치료제 등의 신약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마크로젠 회장)은 “유전자 정보는 성별, 유전병, 신체적 특징 등을 담고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중요한 정보”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치료제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임상 정보가 외국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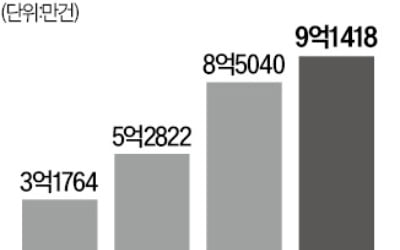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