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1:19
수정2006.04.04 11:21
1978년 5월의 화창한 어느 날.
한국종합금융 부사장을 맡고 있던 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이 부사장, 나 김우중인데요. 잠시 볼 수 있을까요?"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었다.
한국종합금융은 1976년 우리나라 처음으로 설립된 종합금융사로서 대우가 지분을 갖고 있던터라 전부터 김우중 회장과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플랜트 수출 좀 맡아주시오."
김 회장은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플랜트 수출을 맡아달라고 했다.
'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인에게 플랜트 수출이라니. 게다가 내가 아는 플랜트란 고작 팸플릿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김 회장은 금융에 밝은 나를 장차 경영에 참여시키기 위해 가장 어려운 일을 시켰던 것이다.
대우에 몸담은지 한 달만인 1978년 6월이었다.
우간다 상공장관이 대우에 경제사절단을 요청했다.
나도 사절단에 포함돼 이름조차 생소했던 '미지의 땅' 우간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며칠을 날아가 도착한 우간다 비행장은 앞으로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듯 무성한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우간다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들은 대통령 궁으로 가는 대신 엉뚱하게 밀림을 내달렸다.
차로 한참을 달리자 수평선이 나타났다.
남한 면적의 3분의 2나 되는 '빅토리아'호였다.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장대한 광경 앞에 우리 일행은 넋을 잃었다.
'왜 우리를 호수부터 데려온 걸까.'
의문은 곧 풀렸다.
호숫가에 독재자 이디 아민 대통령의 별장이 있었던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별장 문을 여니 아민 대통령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우리는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소. 당신 나라의 발전 경험을 우간다에 전수해주시오."
대통령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간곡하게 청했다.
아민 대통령은 경호실장과 주치의를 한국인으로 둘 정도로 한국에 우호적인 분이었다.
결국 우리는 폐허가 된 우간다 방직공장을 재가동시키는 등 전폭적인 기술지원을 해줬다.
70년대 우리 수출의 대부분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가 시장다변화 정책을 열심히 추진했지만 여전히 대미수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관세였다.
미국은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보호무역정책을 폈다.
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미 철강업계와 의회의 로비로 1978년 카터 행정부는 외국산 철강의 수입가격을 미 상무부가 임의로 책정하는 '트리거 프라이스(trigger price mechanism)'라는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했다.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방아쇠 가격' 정도로 해석되는 이 제도는 트리거 프라이스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는 외국 철강제품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복잡한 절차를 밟을 것 없이 곧바로 덤핑조사로 들어갈 수 있게 한 수입규제방식이었다.
카우보이의 후손다운 이상한 이름의 이 제도는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혔다.
대우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당수의 품목은 자국산업 보호대상 품목이었다.
그러다 보니 트리거 프라이스와 같은 보호관세 대상이 되었다.
과제는 가격을 어떻게 맞추느냐였다.
트리거 프라이스에 맞춰 가격을 높이자니 미국산 제품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았다.
미국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가격을 낮춰 팔아야 하는데 가격을 트리거 프라이스보다 낮추면 덤핑제소를 당해 엄청난 관세를 물어야 했다.
또 덤핑제소를 당하면 쿼터축소 등 많은 제약을 당해 타격이 더욱 심했다.
"방아쇠를 당기지 마라. 건드리면 죽는다."
우리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아야만 했다.
상사맨들은 세계 구석구석을 발로 누비는 장사꾼이다.
특히 대우는 설립 초기부터 내수보다 수출에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모토가 모든 직원의 머리 속 깊이 박혀 있었다.
이로 인해 밑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나라든 일단 들어가보자는 식이었다.
그렇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다보니 미수교국과의 거래도 발생했다.
미수교국과의 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금결제였다.
양국의 외환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없었던 것.
결국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우는 대물거래 방식을 과감히 시도했다.
우리 제품을 팔고 대가로 그 나라의 풍부한 원자재를 들여오는 것이었다.
위험이 뒤따랐지만 잘만 하면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전략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이렇게 해서 개척한 미수교국 중 하나가 수단이었다.
대우는 70년대 중반 수단 시장을 개척했고 이는 우리 정부가 77년 수단과 수교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수단은 북한과 이미 1969년 수교를 한 상태였다.
당시만 해도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수교한 국가에 남한 기업이 파고드는 것은 북한에 큰 위협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동시수교국이 점차 늘어나자 북한 주재원들은 우리 상사원들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항상 납치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요즈음은 종합상사의 위상이 많이 축소됐다.
이제 대부분의 기업은 종합상사에 수출을 의뢰하기보다는 직접 뛰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엄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자 뛰는 것이 이윤을 높이기도 하겠지만 제각기 쏟아 붓는 경비를 따져보면 국가적인 낭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경제체제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종합상사들의 잘못도 있다.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수출대국 대한민국'을 위해 연구해볼 과제라 생각한다.
대우그룹이 해체되어버린 마당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종합상사는 아직도 살아 있다.
문제는 여전히 경쟁력이다.
-----------------------------------------------------------------
[ 약력 ]
35년 서울 출생
58년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60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68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73년 뉴욕 포담대 경영대학원 졸업
58~75년 한국산업은행 근무
76년 한국종합금융 부사장
78년 대우실업 전무이사
79년 대우개발 부사장
81년 (주)대우 사장
95년 (주)대우 회장
2000년~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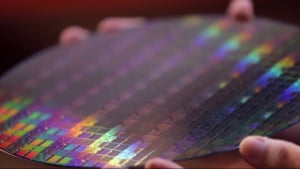
!["갈 길 멀지만…" 2년 만에 활짝 웃은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3223.3.jpg)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살인과 고문조차 서슴치 않았던 폐륜의 과학자와 의사들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205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