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1:55
수정2006.04.04 01:59
"한국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급출발과 급제동에 대비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일 한국증시를 관찰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국시장은 멀미를 느낄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다.
사실이 그렇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 직후 종합주가지수는 300선 아래로 떨어졌다.
98년 구조조정을 조금 하고 나니 지수가 그해 10월부터 뛰기 시작해 99년7월 1,000선을 돌파했다.
외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상승률이다.
200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1,000선과 500선을 청룡열차처럼 오르내렸다.
코스닥시장은 더욱 극적이다.
99년부터 4년동안 지수가 60에서 292로,다시 35로 곤두박질쳤다가 이제 50선 언저리에 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빚어진다고 풀이한다.
한국이 수출입 비중이 큰 외부의존형 경제이며,기관투자가가 육성되지 않았고,증시 규모가 작아 호·악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조급함도 한국시장을 롤러코스터장세로 몰아가는 주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1∼2년내,심지어 몇달 안에 큰 돈을 쥐기 위해 주식투자에 나선 이들이 적지않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면 뒤도 안돌아보고 뛰어든다.
인터넷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고 외국인이 사들인다고 하니 덩달아 '묻지마 사자'주문을 낸다.
삼성전자가 좋을 것이라고 하면 모두 다 삼성전자 주가흐름만 쳐다본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유행을 뒤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조금만 떨어져도 팔아치운다.
여유를 갖고 기다리질 못한다.
여의도 한 주부의 투자일화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던져준다.
그는 90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5천주를 4만원대에 매입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해 지금까지 들고 있다.
초기투자자금 2억원이 1백억원으로 불어나 있다.
한국 증시가 88년 이후 15년동안 1,000선 딜레마에 빠져있는 동안 신세계 롯데칠성 등 우량종목은 모두 수십배씩 올랐다.
'조급함은 투자자의 최대 적'임을 분명히 말해주는 대목이다.
박준동 증권부 기자 jdpower@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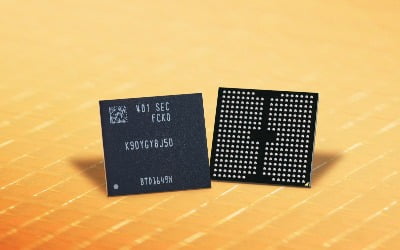









![[단독] 20代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9472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