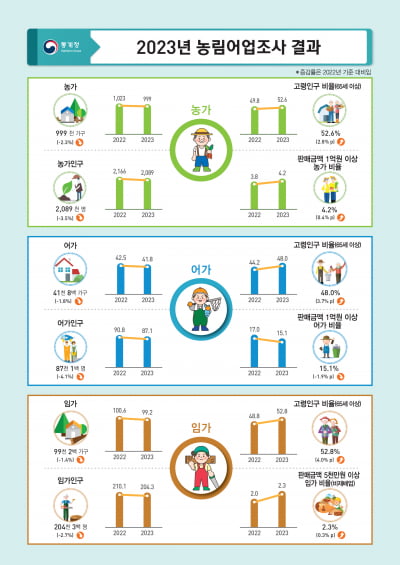입력2006.04.02 08:36
수정2006.04.02 08:40
''공무원 무한 책임론''.
정부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
5개년 경제계획이 한창이었던 1970년대에나 어울림직한 말이지만 지금도 심심찮게 듣게 된다.
언필칭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이지만 상당수 고위 공무원들은 아직도 낡은 시대 무한 책임론의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같다.
20년도 더 전에 사무관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 논리는 강조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현대투신 협상과정,그리고 실패로 귀착된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 말이 거듭 떠올랐다.
"한번 시작한 일인데 끝을 내야지" "공적자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업계(현대 증권3사)에 맡길 수 있나"하는 뿌리 깊은 관료의식은 결국 모든 협상전선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는 동안 ''무한 책임''이라는 슬로건이 포괄하고 있는 독주와 독선,아집과 위선은 언제나 공직자들의 덕목이 되고만다.
협상에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민간 전문가들을 협상일선에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때로는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어서 처음부터 당연히 배제된다.
무한 책임에 걸맞은 완벽한 공무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실패도 부인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의 은폐나 위선을 감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니 한국의 공무원들이 일선에 나서는 협상은 언제나 백전백패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제협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고사하고 상대방의 초보적인 전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들이 돌아가면서 책임을 떠맡기란 결국 실패 밖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담당자의 보직이 자주 바뀌었으니 협상의 전후맥락은커녕 협상구조조차 언제나 헷갈리게 마련이었다.
차라리 공무원들이 무한 책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좋을성 싶다.
이제부터라도 협상장의 우리측 대표선수를 민간인으로 아웃소싱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순수 민간인이 미덥지 않다면 민관 합동으로 매각팀을 구성해보는 것도 좋겠다.
"혼자 다 하겠다"고 고집하다 또 실기하는 것보다는 그 편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