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해산 판결받은 크라운제과
최근 법원으로부터 ''해산'' 판결을 받은 크라운제과의 한 직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기가 찰 뿐"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가 해산 판결을 받은 배경은 대충 이렇다.
전직 임원출신이며 회사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2대주주 김모씨가 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에 해산청구 소송을 냈다.
근거는 1968년 크라운제과가 설립될 당시 정관에 명시했던 ''30년간 존속한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크라운제과에 존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해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지난 85년 회사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조항이 의무조항에서 제외되자 정기 주총에서 특별결의로 이를 삭제했으며 단지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당시 김씨는 상무로서 의사록에 서명까지 한 장본인이며 김씨의 소송제기 이후인 지난해 10월 등기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크라운제과측은 일단 1심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대주주인 김씨가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자신도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극단적 결과를 낳게 한 소송배경은 무엇일까.
김씨는 "1대주주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이 크라운제과의 부실을 초래했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론 도저히 화의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산을 통해 ''제3자 매각''을 하는 편이 오히려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는게 그의 얘기다.
특히 현재 1대주주의 아들회사 명의로 돼 있는 경기 송추의 1백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크라운제과로 다시 돌리는 등 투명경영이 이뤄져야만 회사가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씨는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번 분쟁의 배경을 1대주주와 2대주주의 감정섞인 경영권다툼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회사존속 문제를 놓고 진행되는 법정다툼은 ''도를 넘었다''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법원 판정대로 회사가 청산되면 주주 채권단 협력업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화의를 벗어나기 위해 일하는 종업원들의 진로를 두고서는 더욱 그렇다.
윤진식 생활경제부 기자 jsyoo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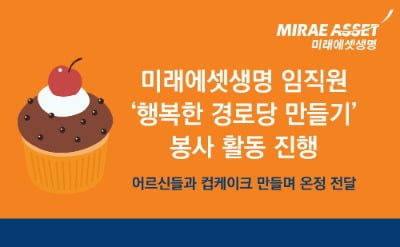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