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실무자까지 희생돼서야
멀리는 지난 97년 한약분쟁에서 가까이는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에 이르기까지 궂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전진 배치돼 추진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독일병정".그의 일에 대한 열정은 정평이 나 있다.
의보재정 파탄위기로 여론의 화살이 몰아치는 요즘에도 보험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느라 퇴근을 잊고 있다.
장석준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계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에서 복지부 차관으로 옮겼다.
그는 취임 당시 사석에서 "이 자리가 나의 낙봉파(낙봉파:삼국지에서 호를 봉추(봉추)로 하는 방통이 적을 쫓다 화살에 맞아 죽은 곳)가 될 수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리곤 위 절제 수술을 받아 편치 않은 몸임에도 보통 새벽 2~3시까지 계속되는 의.정협상을 이끌었다.
의사 딸과 사위를 둔 그는 이 과정에서 바로 딸같고 사위같은 젊은 전공의들로부터 수차례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최선정 복지부 장관이 의보재정 파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경질됐다.
이어 차관과 담당 국장 등 보험정책 라인에 있는 관료들로 문책 범위를 넓힌다는 소식이다.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관계자를 문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형 실패작"인 의보재정 파탄 사태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고 하길래 시행했다"고 토로한 만큼 허위보고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
하지만 실무라인의 인책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리나 직무유기가 아니라 단순히 "그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자들까지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곤란하다.
토론문화가 활성화 돼 있지 않은 우리 관료사회의 여건에서 실무 공무원들은 장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런 실정을 무시하고 "국민정서법"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일괄 문책할 경우 자칫 모든 정부 부처가 "복지부동부"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복지부가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료들의 푸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병연 사회부 기자 yoob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엘리뇨 가고 라니냐 온다…중미, 곡물 생산 차질 우려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928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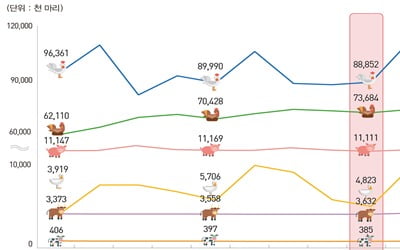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