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二題] 학자금 '낮잠' .. 대출홍보 부족에 절차 까다로워
은행들이 당장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리 5%대의 학자금 대출을 꺼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고 12%포인트 이상의 이자 손해를 보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은행들은 정부 예산 보조를 받는 학자금 대출에 나서고 있다.
농협 국민 주택 서울은행 등은 연 5.75%의 저리로 등록금을 빌려준 뒤 교육부로부터 4.75%의 이자를 보전받는다.
연 10.5%의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은행마다 정부지원액을 고려,자체 대출한도를 결정했지만 정작 이 한도만큼 빌려준 곳은 없다.
지난해 1천억원을 배정받은 서울은행은 한도의 52%를 대출해주는 데 그쳤다.
국민은행의 한도소진율은 67%,주택은행도 80%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해주는데도 이처럼 취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은행들이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건당 취급비용을 따져보면 은행의 이익을 올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학생들이 연 9∼18%의 고금리를 감수한 채 대출 절차가 간편한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까다로운 대출 절차로 은행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것도 다른 이유다.
올해 들어 사정은 더 나빠졌다.
교육부의 대출지원액이 지난해 총 9천억원에서 4천5백억원으로 급감하면서 대학에서 추천장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이를 반영하듯 1천억원을 배정받은 주택은행의 대출액은 현재까지 1백50억원에 머무는 등 은행마다 대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Y대학 문모(25)씨는 "단과대학장 추천장은 이미 포기했다"며 "모자라는 등록금을 빌리기 위해 카드사나 신용금고 등에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천장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K대학 김모(26)씨는 "어렵게 추천장을 받았지만 보증인 세우는 일이 마땅치 않아 은행 대출을 포기했다"고 한탄했다.
K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폭을 두고 학교측과 학생들의 마찰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리의 정책자금이 주무 부처의 무관심과 은행의 냉대로 낮잠자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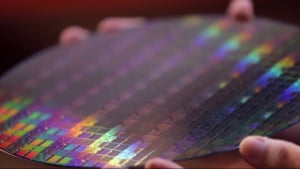
!["갈 길 멀지만…" 2년 만에 활짝 웃은 기재부 경제정책국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23223.3.jpg)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살인과 고문조차 서슴치 않았던 폐륜의 과학자와 의사들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2052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