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코너] 외자 걸림돌 '노사불안'
일본기업들의 한국투자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한국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갑작스런 방일(訪日) 배경에는 산자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은 작년 9월 도쿄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자 연말을 앞두고 고위관리를 일본행 비행기에 태웠다는 것이다.
이 관료는 규슈 오이타 등 일본 지방도시를 부지런히 돌았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거론될 때면 언제나 화두를 장식하는 의제가 두개 있다.
무역역조 시정과 일본기업들의 한국투자 확대가 그것이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지척에 있는 일본기업들이 한국투자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말로만 투자확대,기술이전을 외칠뿐 행동으로 옮긴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한·일관계는 역사상 가장 우호적이었고,따라서 일본의 한국투자도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사관측은 계약체결 실적에 관해서는 말꼬리를 감춘다.
그러나 일본자본을 손님으로,이를 끌어들이려는 한국정부와 기업을 주인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경우가 달라진다.
일본경제계는 대한(對韓)투자의 최대 불안요소를 노동문제로 꼽고 있다.
이는 재계리더와 한국전문가,교수들의 입을 통해서도 수없이 확인된다.
아무리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미소를 지어도 파업과 노사분규가 반복되는 한 일본자본의 한국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 언론기관은 최근 중국특집보도를 통해 일본기업들이 돈뿐 아니라 최첨단기술까지도 중국으로 옮겨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 배경 중 하나로 싼 인건비외에 안정된 노사관계를 꼽았다.
1998년초 한국에는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가 넘쳐 흘렀다.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도 일본사람들에게는 한국이 여전히 노사불안으로 투자하기에 겁나는 나라로 비쳐지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엘리뇨 가고 라니냐 온다…중미, 곡물 생산 차질 우려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928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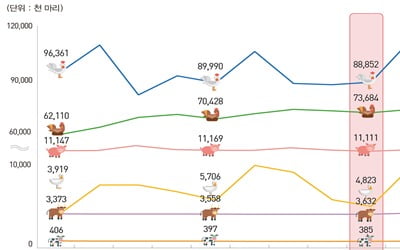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