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정통부 'IMT-2000' 딜레마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 문제 때문이다.
정통부는 당초 기술방식을 업계 자율에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동기 비동기로 나뉠 줄 알았다.
최근까지도 정통부는 이점에 대해선 ''걱정 말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모든 사업자들은 비동기를 고집하고 있다.
정통부가 비로소 당황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정통부의 한 고위관리는 "기술표준이 어떻게 돼갈 것 같냐"는 질문에 엉뚱하게도 특정업체 얘기를 꺼냈다.
"S업체의 해외전략제휴가 결렬됐다"는 식의 얘기였다.
"직접 확인된 사실이냐"는 물음에 "확인된 바는 아니고…" 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왜 하느냐"는 재차 물음에 "S업체가 동기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증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그것도 책임있는 당국자가 특정업체를 동기식으로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겉으로는 업계자율이라 하면서 다급해지자 특정업체를 동기식으로 몰겠다는 정통부의 의지를 교묘히 언론에 흘리는 것 이상은 아니다.
이 관리는 2주전만 해도 "두고 봐라. 어느어느 업체는 분명히 동기를 들고 나오게 돼있다"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또 "업계의 자율과 업체의 자율은 다르다"며 특정업체에는 강제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간접 표현했다.
심지어는 "채찍이 준비돼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일각에선 정통부가 뒤늦게 당혹스런 처지에 놓인 것은 지나친 ''몸사리기''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고 있다.
기술표준처럼 국가 통신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는 정부가 나서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업계의 자율''이라는 대의명분만 내세우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지난 주말 제주도까지 내려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정통부가 뚜렷한 방침을 제시할 때가 왔다.
업계에선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합리적인 선에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종태 정보과학부 기자 jtch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엘리뇨 가고 라니냐 온다…중미, 곡물 생산 차질 우려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928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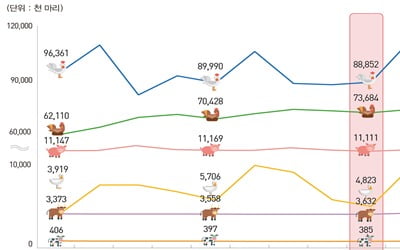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