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업인] '정유회사 사장' .. 원유 안정확보 '대들보'
(현 유공)를 인수한 것은 재계의 빅이슈였다.
그러나 선경이 치열한 경합속에 유공을 인수할 수 있었던 첫번째 요인은
맹렬한 로비도, 당시 정권과의 친소관계 때문도 아니었다.
바로 사우디 왕실, 야마니 석유장관 등을 포함한 국제석유시장 리더들과
특수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최종현 선경회장의 "원유 학보 능력"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선경의 유공 인수에서 보듯 정유업체 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역할은 바로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이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국내 석유산업은 유공과 걸프가 합작해 지난 64년 하루 3만5천배럴 정제
능력을 갖춘 울산정유공장을 완공하면서 시작됐다.
30여년이 지난 현재 정제능력은 2백45만배럴로 세계 5위다.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급성장한 만큼 사장들의 역할도 많이 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안정적인 원유도입이라는 "기본 과제"외에 업계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일이 많이 추가됐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마케팅.
특히 90년대들어 쌍용정유 현대정유 등 후발업체들이 정제능력을 키우면서
정유업계는 전에 없던 마케팅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유가자유화에 따라 가격이 마케팅의 새 변수로
부상하면서 정유사들의 내수시장 쟁탈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가정책을 밀어붙일 것인가, 소비자가
좋아하는 저가판매를 시작할 것인가의 선택은 전적으로 사장이 "결심"
해줘야 하는 문제다.
정책결정 뿐만 아니다.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모자쓰고 주유소에 나가 주유기를 들고 손님
응대를 하는 일은 80년대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사장의 역할이다.
해외비즈니스도 더욱 다양해졌다.
기름을 사러 다니는 일외에 이제는 제품을 팔려고 다닌다.
내수점유율보다 많은 생산량을 수출할 수 밖에 없었던 쌍용정유 현대정유
외에 지난해부터는 업계 1,2위인 유공과 LG칼텍스정유도 일본에 휘발유를
수출하는 등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유전개발 프로젝트도 사장이 직접 챙기는 중요한 일중 하나다.
외국과의 합작사인 LG칼텍스정유와 쌍용정유는 합작선과의 업무협의
때문에 사장이 외국에 나가는 일이 특히 많다.
뿐만 아니다.
기존 정유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수익중심으로 사업기반을
재구축하는 작업도 새롭게 생긴 과제다.
메이저 에너지회사를 비전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정유 하나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밀화학(유공) 석유화학(LG칼텍스정유 쌍용정유 현대정유) 발전사업(한화
에너지) 등으로 가닥을 잡은 다각화작업의 방향설정과 추진은 사장의 결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다.
공장을 잘 돌리고 원유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됐던 "편안한
기름장수" 모습은 이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역할이 늘어난 만큼 이들의 어깨도 무거울 수 밖에 없다.
국제 원유값이 갑자기 들썩거리고 중동지역에 "성냥불"이라도 붙었다는
소문이 돌면 며칠씩 잠 못드는 밤이 계속된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지만 정부의 호출에는 언제든 즉시 응답을 해야 한다.
수급문제를 이유로 소집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중요한 외국 파트너와의
약속도 다 팽개쳐야 한다.
새로운 세금이 부과돼 휘발유값이 조금만 올라도 "정유사가 소비자는
아랑곳않고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있다"는 소비자들의 오해에 시달려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난 30여년간 국내 정유업계가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냈다는
사실이다.
고개 숙이고 기름 구하러 다니던 고단한 신세에서 이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우리 상표의 휘발유를 수출하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각사마다 21세기 메이저업체로서의 웅비를 꿈꾸고 있을 정도다.
이 모든 것은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고 발빠르게 변신했던 정유회사
사장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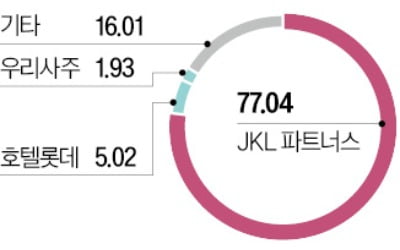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