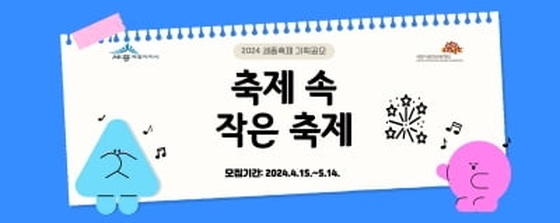[한경칼럼] 민간조직 변해야 .. 박상희 <아주실업 회장>
변화와 개혁이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종전의 사고와 관행과 타성으로는 살아남을수
없다.
새로운 경쟁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조직축소 규제완화등 전에없는 행정개혁을
추진중이다.
해묵은 관료적 적폐를 몰아내기에 골몰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경영혁신에 여념이 없다.
이곳저곳의 세미나와 강연회는 조직재편의 당위성과 판갈이를 강조하는
내용의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이 단골주제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변신의 몸부림을 치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변해야 할곳이 수많은 민간단체조직이다.
각종 협회와 조합(중앙회) 연구원 연합회등의 경제사회단체조직은
정부와 민간의 사이에 있다.
"민"을 대변하면서(?) "관"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도록 매개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들 민간조직은 과거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지내오면서 알게
모르게 관료화되어 온게 사실이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채 오히려 관쪽을 향해 눈치보며 몸사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직이란 가만히 내버려두면 속성상 커지게되고 지나치게 커지면
관료화되게 마련이다.
관료화된 조직에선 조직원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내부통제와 명령지시가
중시된다. 점차 권위주의가 싹트고 지도자는 군림하게 된다.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토론은 간데없이 일방하향의 톱다운시스템이
구축된다. 조직원들은 책임감 긍지를 잃고 사기는 떨어진다.
조직이 목표하는바 이념구현이나 정책수행의 창의성 기동성은 사라지고
만다. 새시대가 바라는 개혁은 먼데 있지않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그마한 조직부터 하나하나 민주화시키고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다원화를 지향하는 우리 경제사회공동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6042282.3.jpg)
![[윤성민 칼럼] 韓 대파로 싸운 날, 美·日은 의형제 맺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14213006.3.jpg)
![[데스크 칼럼] 통신사는 왜 동네북이 됐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2124465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