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개혁시대 정치권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면 행정부가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면 정치권이 행정부의
소극성을 질타하며 좀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상식이었다.
대체로 행정부측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수순을 밟아가며 변화를
추구하려는 반면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표시나는 변화를 요구해 왔다는
얘기다. "관치"로 이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온 엘리트 관료집단으로서는
아무래도 칼자루 내놓기를 주저하게 마련인데 비해 정치인들은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탓이다.
생리적으로 전문가집단인 행정부는 "현실"과 "효율"을 앞세우는 반면
정치집단인 당은 "여론"을 우선해 왔다는 말이다. 적어도 "점진적인"
변화만이 가능했던 과거에는 그랬다.
하지만 요즘은 자리가 바뀌었다. 정부는 위험스럴 정도의 급진적인
개혁안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 내놓고 정치권은 개혁의 강도를
누그러트리기에 급급하다. 마치 정부가 추진하는 변화를 말리는게
정치권의 본업이 된 듯한 양상마저 보일 정도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을 소급적용이라는 이례적인 수단까지
동원해가며 대폭 줄여놓은 것이나 금융실명제를 무르게 하는데도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는게 그 사례다. 1일에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자마자 "더
깎으라"고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다.
물론 부작용이 극소화 돼야만 개혁이 성공한다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펴고있다. 행정부가 책상머리에 앉아 이상론적인 개혁안을 꾀하고 있다면
마땅이 저지해야 한다. 또 개혁의 방향이 타당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최대한 구제토록하는게 정치권의 소임인 것은 분명하다.
한데 요즘 정치권에서 제기한 주장의 이면을 찬찬히 뜯어보면 "부작용
최소화"의 대상이 "선의의 대다수"가 아니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배우자명의 예금이 수억원을
넘더라도 남편 돈이 확실하면 빼야한다 든지 배우자 상속세공제 기본한도를
대폭 확대하라는게 민자당의 요구인데 배우자에게 줄 재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다. 농림수산업에 대한 감면축소계획 철회나
유류특소세율인하 같은 그럴듯한 주장도 "부유층 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쓴 가면쯤으로 여겨지는것도 이때문이다.
이를보고 정치권이 스스로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시각도
없지않다. 부작용을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개혁에 쫓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인식이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유일한 집단"이란말이 공연한 트집은 아닌것 같다.
<정만호경제부기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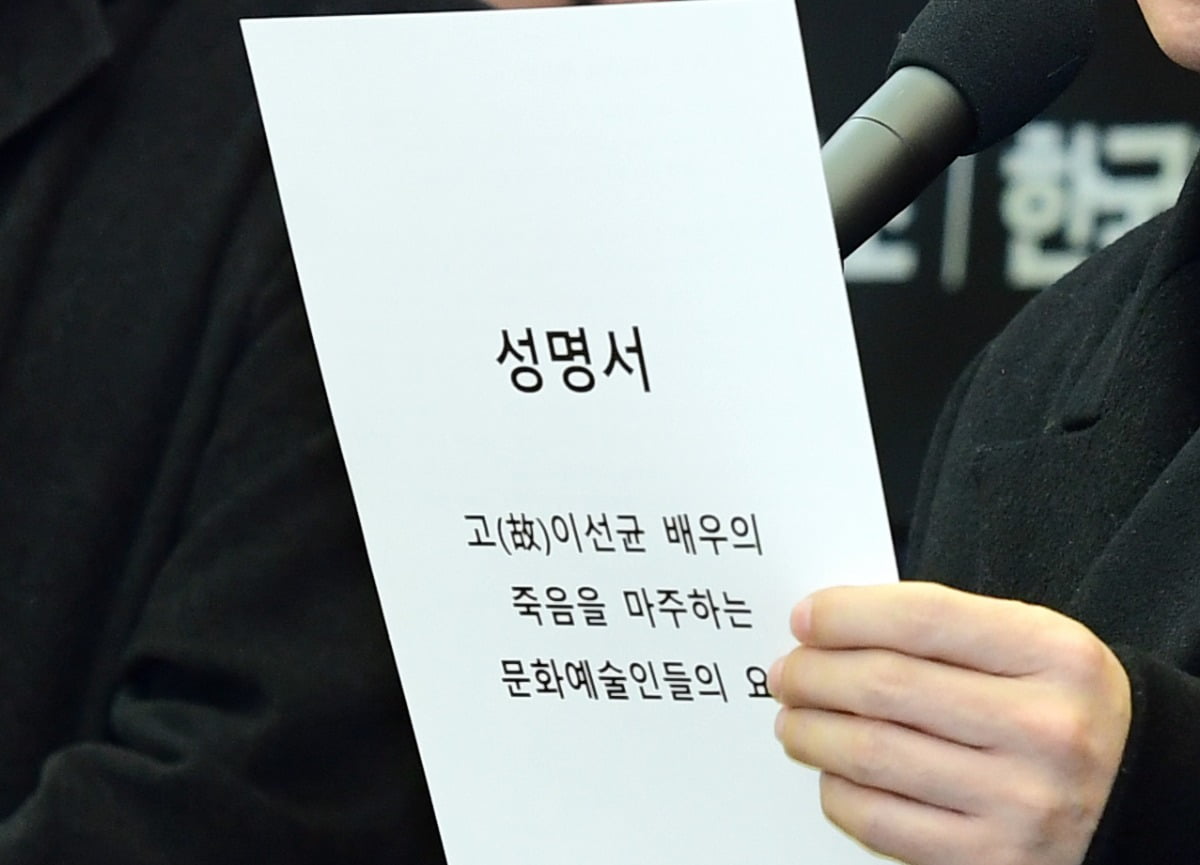
![악재 투성이에 힘 못 쓰는 '비트코인'…어디까지 떨어질까 [강민승의 트레이드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77755.3.jpg)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