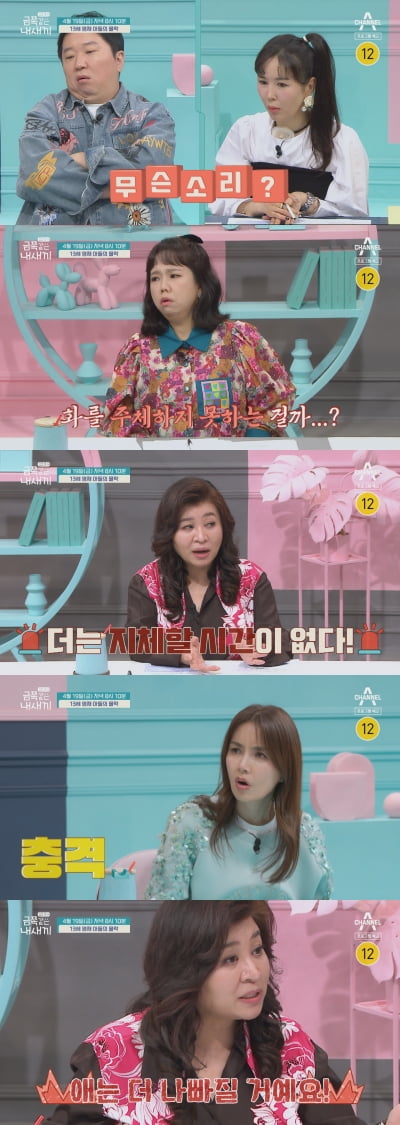[한경칼럼] 진정한 서비스 .. 정지태 상업은행장
또는 어디서 본 듯한 풍광이나 정취를 맛보기도 한다.
가령 소설의 글귀 중에 이런게 있다 치자.
"뽕나무가 있는 저편 언덕에는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고,어미소가 송아지의
재롱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4월의 시골풍정은 우리를 얼른 그곳으로
달려가게 한다"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전에 한번도 가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글쓴이와 똑
같은 풍경을 상상속에서 그려낼 때가 있다.
풍경 뿐 아니라 작가의 생각 경험, 도까지도 포함된다. 물론 꼭똑이
그려내지 못할 때도 있게 마련이다.
작가가 그린 세계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를 독자가 상상해 내거나,또는
상상해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문학용어로는 "앰비규티"(Ambiguity)라
한다.
우리말로 "애매모호함"으로 번역되는,말하자면 작품에서 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라 할수있다.
그런 점에서 훌륭한 고전들은 바로 "앰비규티"가 극히 적은 작품이라고
볼수있다. 글쓴이가 그런 정념의 세계와의 완전한 합일이랄
수있고,그럴때는 무의식 중에 무릎을 치기도 한다.
저편의 생각과 풍정과 이해와 경험이나 의도따위를 이편으로 건네준다는
의미에서 은행원도 똑같은 전령사인 셈이다. 다만 색깔도 냄새도
없고,측정할수도 없고,손끝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서비스를 매개수단으로
고객의 극대만족을 꾀하려드니 말이다.
카운터의 이편과 저편에 대결하듯 서 있으면서도 고객의 만족을 끌어내어
뜨거운 감동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서비스의 "앰비규티"를 줄일수 없을까
하는 것이 요즘 고객 만족의 비결로 여겨지며 이것이 금융권의
최대관심사이다. 그러나 고객이 만족할수 있도록 이편에서 주는 비결의
대부분은 "인사를 잘하자""고객에게 관심을 보이자""전화를 잘 받자"는 등
주로 접객태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서비스의 유치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보다 발전된 단계의 서비스는 까다로운 주문같지만 투철한 직업관에서
비롯된 혼이 깃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그 혼을 불어 넣자고 외쳐서 될 일
또한 아니다. 스스로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야 될 터인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