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은 쓸모 없기 때문에 쓸모 있다
박산호 지음
<소설의 쓸모> (메디치미디어, 2023)
소설은 근대 이후로 문학의 가장 중추적이며 대표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였고, 문학은 근대를 지나오면서 ‘쓸모없음’을 미덕으로 어필하여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근근이 생존하고 있다.요컨대 문학은 쓸모가 없어서 쓸모 있는 것이 된다는 말인데, 이는 사사로운 말장난이 아니라,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의 유려한 주장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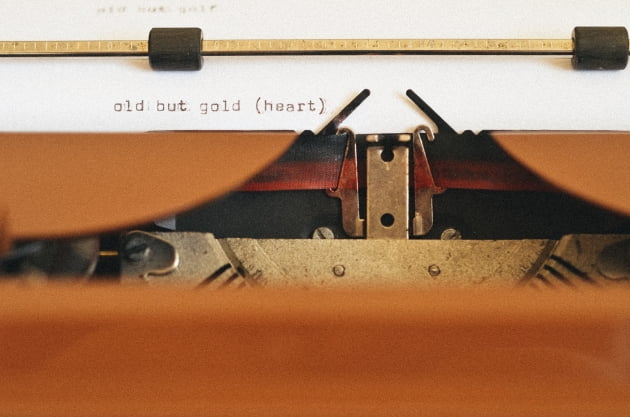
하지만 소설의 아이러니한 효용은 지금의 시점에서 루카치가 말한 밤하늘의 별자리만큼 멀어 보이기도 한다. 과연 인간은 소설의 고발로 인해 달라질 수 있는 존재인가? 대체 인간은 현실의 억압을 인지하고 나아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는 하는가?
편집자로 일하며 몇 권의 소설을 만드는 동안, 내 안에서 저 질문에 대한 낙관적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많은 독자를 만나길 바랐던 많은 소설이 그렇지 못했을 때마다 그 대답은 유보되었다.
박산호 산문집 <소설의 쓸모>는 문학과 소설을 둘러싼 아이러니의 갑옷을 벗기는 데 집중하는 책이다.
우선 저자는 생계로서의 쓸모를 소설로부터 발견하게 한다. 그 자신이 80권이 넘는 영미권 소설과 그래픽 노블을 우리말로 옮겼으니, 그에게 소설은 삶의 유용한 수단이었음은 분명하다. 거기에 그의 읽음과 번역에 대한 진심은 소설의 쓸모를 먹고사는 데의 수단 이상의 것으로 끌어올린다.
번역가이기에 한 자 한 자 곱씹어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작업은 <소설의 쓸모>에 이르러 소설이 현실을 고발하는 양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최신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다. 스릴러를 중심으로 한 그의 웅숭깊은 취향은 비교적 최근의 여러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그 손을 잡음으로써 새로운 사고를 하고 내 안의 용기를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위 네 권이 필자가 읽은 것들이기에, 귀납적으로 장담하건바 <소설의 쓸모>에서 소개하는 소설은 무척 재미있다. 재미있기에 쓸모있을 것이고, 재미라는 쓸모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소설의 또 다른 쓸모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자를 읽을 줄 몰랐던 여인의 삶과 파국을 그린 <활자 잔혹극>을 통해 문자 중심의 세계에 의문을 품고, 더 나아가 진정한 소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시녀 이야기>를 읽고 작금의 가부장적인 세계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의 디스토피아를 체험하며, 현실의 불평등을 다시 조망할 수 있다.
<불타는 소녀들>에서는 우리 안의 우리도 모르는 편견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한 인식 다음 할 일을 함께 도모할 수도 있다.
<베이비 팜>에서의 현존하는 대리모 문제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고, 돈과 효율로 따질 수 없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다.

수많은 콘텐츠 사이에서도 아직 소설은 읽을 만하다, 읽어도 좋다. 읽어야 한다. 버젓이 존재하는 소설의 쓸모를 놓치고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11자녀 가운데 아홉째가 형·누나에 묻고 1960년대를 쓰다 [홍순철의 글로벌 북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09402.3.jpg)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