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의 건축] 범선이 하늘로 떠오르듯 빛나는 곡선형 유리지붕
![[이 아침의 건축] 범선이 하늘로 떠오르듯 빛나는 곡선형 유리지붕](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AA.31631987.1.jpg)
이 모순된 표현을 60여 년간 건축에 적용한 사람이 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다. 지난 60여 년 동안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디즈니콘서트홀 등 각 도시의 얼굴이 된 건축물을 세웠다.
프랑스 파리 서쪽 불로뉴숲 끝자락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루이비통 재단’은 그중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게리의 역작이다. 곡선형 유리 지붕 12개가 중첩돼 멀리서 보면 마치 커다란 범선이 숲에서 하늘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콘크리트 패널이 1만9000개, 유리 패널이 3600개 이상 쓰였다.
2004년 명품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게리와 미술관을 만든다고 발표하자 파리시는 50년 뒤 시에 이를 기증하는 조건으로 50년간 부지를 임대했다. 숲을 보존하려는 시민단체와의 소송 끝에 8년 만인 2014년 10월 모습을 드러냈다. “프랑스의 깊은 문화적 소명을 상징하는 웅장한 선박을 파리에 설계하는 게 오랜 꿈이었다”는 건축가의 말처럼 이곳은 연간 500만 명이 찾는 프랑스의 상징이 됐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이 아침의 건축] 절반이 뻥 뚫린 건물, 그 안에서 음악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AA.3149727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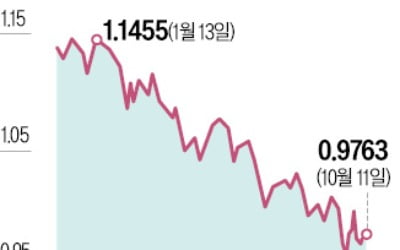











![美 인물화 거장의 붓질을 바꾼 건…'두 번의 로마의 휴일'이었다 [제60회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003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