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가 사람을 만든다?…패션이 '테니스 매너'를 완성한다!
코트 위의 절대법칙, 테니스웨어
엄격한 복장규정에
경기복 잘못 입으면
'출전 불가' 되기도
윔블던은 '올 화이트'
속옷까지 흰색 입어야
1920년대 코르셋서
점점 진화한 테니스복
현재 일상복 자리 넘봐
테니스 상징 '손목시계'
리처드밀 나달 전용 시계
롤렉스 메이저 전부 후원

테니스는 오랜 역사만큼 유독 패션 아이템이 많이 떠오르는 스포츠 종목이다. 스커트와 피케셔츠, 손목시계와 헤어밴드까지…. 지금은 애슬레저(애슬레틱+레저)룩의 인기로 테니스웨어가 일상복처럼 됐지만, 프로 선수들의 세계에서 테니스웨어는 엄격한 복장 규정으로 논란을 낳기도 했다.
20세기 테니스 코트는 ‘런웨이’
1920년대 테니스웨어는 운동복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헤어 터번과 미디스커트가 대유행했다. 당시엔 파격적인 스타일이었다. 여성들에게도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했다. 프랑스 선수 수잔느 랑글랑은 1926년 경기에서 종아리 길이 주름치마에 짧은 소매 블라우스를 입었다. 랑글랑은 세계적 인기를 누린 최초의 여성 스포츠 스타이기도 하다.1930년대엔 치마가 짧아졌지만 여전히 우아한 클래식의 시대였다. 골프 선수들이 많이 쓰는 선캡도 테니스 코트에 처음 등장했다. 스니커즈와 주름치마, 소매 없는 블라우스가 등장하며 ‘테니스룩’이 본격 시작됐다. 1940년대엔 무릎 위까지 오는 치마가 보편화됐고, 편안한 운동화도 많아졌다. ‘마릴린 먼로 스타일’이 유행하며 굵은 웨이브 머리의 플레이어가 많았다. 허리를 꽉 조이는 1960년대 스타일을 지나 1970년대엔 컬러TV 시청자를 의식한 ‘짧은 치마에 예쁜 테니스룩’이 번졌다. 땀이 빨리 마르고 통풍이 잘되는 가벼운 소재의 스포츠웨어는 1980년대에 대거 등장했다. 헤어밴드가 등장해 테니스룩을 완성했다.
땀에 비치는 부분, 속옷까지 ‘흰색’
세리나 윌리엄스의 캣슈트가 등장한 프랑스오픈보다 복장 규정이 더 엄격한 대회는 영국의 윔블던이다. 윔블던은 성별에 관계없이 출전하는 선수들이 반드시 하얀색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에는 ‘땀에 의해 비치는 부분도 흰색이어야 한다. 속옷 역시 흰색이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 9항을 신설해 규정을 더 강화했다.엄격한 규정에도 100년이란 기간 동안 테니스웨어 역시 진화를 거듭해왔다. 여성 테니스복은 점점 짧아지고 타이트해지다가 최근에는 일상복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기에 이르렀다. 올해 르꼬끄가 선보인 테니스웨어는 블록재킷, 폴로티셔츠, 플리츠스커트, 원피스 등인데 운동 시에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나달의 손목 위 그 시계 18.83g
테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는 손목시계다. 테니스팬들 사이에선 라파엘 나달과 리처드밀의 일화가 유명하다. 리처드밀은 나달이 자사 손목시계를 착용하길 원했고, 예민하기로 유명한 나달은 이를 거절했다. 리처드밀은 2010년 나달이 편히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시계 RM027을 개발했고, 나달은 이후 꾸준히 리처드밀 시계를 차고 경기에 출전했다. 이 시계 무게는 18.83g.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윔블던 US오픈까지 4대 메이저를 모두 후원하는 시계 브랜드도 있다. 롤렉스는 네 대회를 모두 후원한다. 테니스가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이 명품 시계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잘 맞아떨어져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이만 한 스포츠가 없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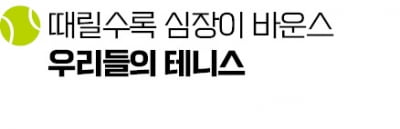











![르세라핌, 美서 라이브 '대참사'…'K팝 아이돌' 논란 터졌다 [이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38208.3.jpg)